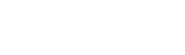유럽여행기 [268] 여행단상 21 : 유럽의 마을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2-01-05 13:41 조회 1,006회 댓글 0건본문
유럽의 마을들
2006년 1월 1일. 그리이스의 파트라(Patra)항으로부터 16시간이나 걸린 항해 끝에 이탈리아의 바리(Bari)항에 도착했다. 바리 항에서 A14/E55번 도로를 타고 한동안 아드리아 해변을 따라 달리다가 A16/E342번 도로로 바꾸어 타고 나폴리를 거쳐 도달한 곳이 폼페이다. 아드리아 해에서 이탈리아 반도 남쪽을 횡단하여 지중해로 나온 셈이었다. 오는 도중 절경으로 꼽히는 깜빠니아(Campania) 지역을 지나면서는 이탈리아 자연의 진수도 맛볼 수 있었다.
오면서 아름다운 마을과 도시들을 많이 만났다. 그 중 두드러진 몇몇은 특히 잊을 수 없다. 그 가운데 압권은 산꼭대기에 형성된 도시들. 대부분 정상의 고성을 중심으로 취락이 이루어져 있기도 하고, 돔을 중심으로 주택들이 늘어서 있기도 했다.
물론 달리면서 흘끗 본 광경이라 정확한 모습은 아닐 수도 있고, 더욱이 달리는 도중이라 사진을 찍을 수도 없었다. 그러나 그런 예들이 자주 나타나면서 그간 돌아본 유럽 여러 나라의 마을들이 파노라마처럼 떠올랐다. 일종의 ‘스테레오 타입(Stereo type)’이랄까. 마을을 형성하는 데 작용한 ‘유럽 고유의 스타일’이 분명 있음을 비로소 깨달았다.
***
스위스의 마을들은 대부분 높은 산 위에 자리 잡고 있었다. 국토의 평균고도가 높기도 하려니와 오랜 기간 지속된 외침(外侵)의 역사에서 배운 삶의 지혜일 것이다. ‘마운틴 고트(mountain goat)’들처럼 수직에 가까운 절벽을 디딘 채 살아가는 그들을 직접 보았다. 발 디딜 틈만 있으면 집을 짓고, 마을을 만든 그들이었다. 그래서 나는 스위스 인들에게 ‘거미인간’이란 별명을 붙여주기까지 했다.
지난 달 터키의 카파도키아에서 만난 어떤 마을은 앞으로 오래도록 잊지 못할 것이다. ‘위치히사르’란 동네였다. 정상엔 인공의 성처럼 생긴 자연 암석이 우뚝 서 있었다. 물론 옛날엔 사람들이 살았고, 지금도 그 공간을 사람들이 이용한다. 그 주위로 많은 ‘췸니’들이 즐비하게 늘어서서 하나의 큰 집단을 이루고 있었다. 그 췸니들에는 물론 사람들이 살고 있거나 호텔, 펜션 등 숙박업소들이 영업을 하고 있었다. 지대가 워낙 높아 멀리서도 분명히 보이는 마을이었다.
독일의 마을들도 터키의 마을들도 대부분 산 중턱 이상의 높은 지대에 이루어져 있었다. 그것도 대개 빨간 지붕과 하얀 벽의 공통된 형태와 색으로.
물론 해안 마을들은 예외였다. 예컨대 아드리아 해안의 크로아티아와 에게 해 연안의 터키와 그리이스. 이 나라들 모두 해안에 바로 붙어 형성된 마을이 있는가 하면 산중턱 이상에 자리 잡은 마을도 있었다. 말하자면 해안의 마을들은 이중 구조를 이루고 있는 셈이었다. 마을들 모두 바다를 바라보고 있긴 하나, 위치가 바닷가와 산 중턱으로 나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우리가 목격한 유럽 마을들의 대부분은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다. 물론 카파도키아의 지하도시도 있긴 했지만, 그건 특수한 경우였다. 높은 곳은 아니라 해도 최소한 계곡 속에 숨어 있는 마을을 본 기억은 별로 없다.
***
우리는 예로부터 산등성이에 ‘오뚝하게’ 집을 짓는 경우가 거의 없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차가운 북풍을 피해야 하고, 난리로부터 안전해야 하며, 물을 얻기 쉬워야 한다는 등의 조건들. 말하자면 피난하기 좋고 은둔하기 좋은 곳을 명당이나 길지(吉地)로 택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잠시 쉬려고 만든 정자라면 모를까. 사방이 훤히 내려다보이고, 사방에서 훤히 자신을 볼 수 있는 언덕 위에 집을 짓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시대가 바뀐 지금이야 누구든 남보다 높은 곳에 집을 짓고 싶어 한다. 햇볕도 많이 받고 멋진 조망도 독차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집들을 산 밑 혹은 골짜기 한 켠에 ‘숨듯이’ 짓기 일쑤였다.
그래서 마을이나 도시가 저지대나 평지에 조성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저 앞에 냇물이나 강이 흐르고 뒤에 높은 산이 있는 곳이면 우선적으로 길지였다. 높은 산은 차가운 북풍과 외적을 막기에 효과적이요, 물은 생활용수나 농업용으로 긴요하며 외적의 침입 또한 얼마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정감록>>이나 <<택리지>>도 사실 최적의 ‘은둔처’나 ‘방어지’를 물색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저 ‘안온하게만’ 살아갈 수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하던, 우리 민족의 ‘평화 지향성’을 주택이나 마을의 형성에서 읽을 수 있다는 것이다.
***
그러나 숨는다고, 방어만 한다고 난리를 피해갈 수 없었음은 우리의 역사가 입증한다. 자꾸 숨기로 한다면 결국 어디로 갈 것인가. 땅으로 스며들 수도 없고, 하늘로 솟을 수도 없는데 말이다.
그럴 바엔 차라리 처음부터 높은 곳에 자리 잡아 밀려오는 적들을 내려다보며 맞이하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방어를 하건 공격을 하건 언제나 내려다보는 자가 유리하기 마련이다. 물론 겨울의 찬 바람이 걱정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건 그것대로 대책을 세우면 되지 않겠는가.
유럽의 도시나 마을들을 보자. 대개 높은 곳에 성을 쌓고 그곳엔 다스리는 자가 산다. 백성들은 그 주변에 집을 짓고 생업에 종사한다. 다스리는 자는 백성들을 보호해 주고, 그들로부터 섬김을 받는다. 또한 세금을 받아 나라를 운영한다. 그래서 외적이 침입해 오면 위 아래가 힘을 합쳐 싸울 수 있었다.
우리는 어떤가. 숨어 살다보니 늘 당할 뿐이었다. 외적이 침입해도 아무런 방책이 없었다. 우선 외적들이 어떤 경로로 어떤 기세로 몰려오는지 볼 수가 없다. 경복궁에 ‘콕 박혀 있는’ 임금이, 무능한 대신들이 무슨 방책을 세웠겠는가. 결국 남한산성으로 도피했다가 손을 들고 말았지만. 만약 제대로 될 일이었으면, 남한산성을 거점으로 삼아 도성이 이루어졌어야 한다. 남한산성을 구축하고 임금이 그곳에서 국정을 운영하며, 백성들은 그 주변을 둘러싼 채 집을 짓고 생업에 종사했어야 한다. 만약 그런 역사가 지속되었다면, 억울하게 당한 외적의 침탈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을 것이다.
우리는 늘 입으로는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고 말한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늘 하는 일은 ‘소극적인 방어’에 그친다. 지금 이 정부가 극력 강조한다는, ‘교전 수칙’ 또한 그런 예에 해당할 것이다.
왜 유럽의 선진국들이 오늘날과 같은 부와 명예를 가질 수 있었는지, 우리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자신들의 현안들을 처리해나갈 수 있는지. 그 해답의 일부는 집과 마을, 그리고 도시의 위치에서 얻을 수 있었다. 시련을 피하지 않고 과감히 마주 서서 해결하고자 하는 의지를 그들은 갖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마을의 위치나 구조에서 그것을 읽을 수 있었다.
우리가 지금보다 발전하려면 외부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외부인들을 친구로 맞이하건 적으로 맞이하건, 먼저 나서서 이른바 ‘이니셔티브’를 잡아야 한다. 이제 은둔의 고사(高士)가 존경받는 시대는 더 이상 아니다.
그래서 그간 높은 곳에 집을 짓거나 마을을 만들고도 쾌적하게 살아왔고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는 그들이 부러웠다.
**사진 위는 터키 카파도키아의 위치히사르, 아래는 이탈리아 바리 항에서 나폴리로 가는 도중 만난 산 위의 마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