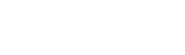유럽여행기 [161] 헝가리 제1신(9) : 살아 움직이는 역사와 문화의 큰 바다, 부다페스트(9)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2-01-04 14:35 조회 770회 댓글 0건본문
헝가리 제1신(9) : 살아 움직이는 역사와 문화의 큰 바
다, 부다페스트(9)
우리가 신청한 것은 오후 2시 투어. 시각이 되자 군인들은 우리의 표를 점검했다. 우리는 군인들의 뒤를 따라 건물 옆으로 들어갔다. 그러자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검색대였다. 공항에서보다 훨씬 엄격한 검색대를 통과했다. 나 같은 경우는 서너 번이나 왔다 갔다를 반복해야 했다. 자동차 키, 카메라 배터리, 작은 기념품 등. 모든 것이 검색대의 경고음을 울리게 만들었다. 검색대의 까다로움보다 불편한 것이 직원들과 경비원들의 고압적인 자세. 아직도 사회주의의 터널을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촌스러움’으로 단정하고 나니 좀 마음이 가벼워졌다.
내부에 들어가자 국회의사당 전속 가이드가 기다리고 있었다. 삼십 명을 넘는 관광객에 단 한 명의 가이드. 그녀의 설명이 개미소리처럼 들려왔다. 국회의사당의 화려한 내부에 압도당한 우리.
과연 엄청난 규모와 화려함이었다. 세상에, 이렇게 아름답고 큰 국회의사당이 있을 수 있을까. 투어 내내 우리의 입은 다물어지지 않았다. 2층 로비에서 11세기 성 슈테판 이래 이어져 내려온 헝가리의 왕관을 친견할 수 있었다. 사파이어와 에머럴드로 장식된 황금의 왕관. 옆으로 기운 십자가가 이색적인 왕관. 이미 우리는 그 모조품을 부다 지구의 마차시 성당에서 본 바 있다.
마지막으로 회의실을 보았다. 전체 국회의사당의 크기에 비해 회의실은 작았다. 국회의원들 숫자가 많지 않은 듯. 의원석과 내각석이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었다. 쫓기듯 밀려나오면서 만감이 교차했다. 관공서를 조금만 호화롭게 짓고자 하면 들고 일어나 반발하는 우리나라가 생각났다.
‘어차피 개인이 살려고 짓는 집이 아닌데, 좀 호화롭게 지은 들 무슨 문제가 있을까?’ 평소의 내 생각이었다. 그 생각은 유럽에 오면서 맞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었다. 호화판으로 짓는다고 욕할 게 아니라, 이왕 지으려면 수백 년 후에도 기념비적인 건축물로 남아 후손들이 관광수입이라도 올릴 수 있게 만들어 달라고 주문해야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어찌하여 우리는 늘 ‘오두막집’ 수준의 건축물만을 고집해야 하는가.
돌아오는 길은 착잡했다. 우리가 미처 모르고 있던 헝가리 인들의 자부심은 바로 이런 역사와 예술로부터 나오는 것임을 깨달았다. 박물관과 국회의사당. 그곳엔 그들의 과거·현재·미래가 역동적으로 뒤섞여 있었다.
답답해진 마음을 풀기 위해 눈 내리는 강변을 걸어 세체니 다리를 건넜다. 다리 위에서 바보는 도나우 강은 드넓었다. 그 강줄기 좌우로 펼쳐진 부다페스트는 또 다시 역동적인 관광지의 새로운 밤을 맞이하기 위해 따스한 불들을 켜고 있었다.
<계속>
**사진 위는 국회의사당 회의실, 아래는 입장을 기다리는 관광객들
2005-11-27
- 이전글[162] 헝가리 제1신(10) : 살아 움직이는 역사와 문화의 큰 바다, 부다페스트(10)
- 다음글[160] 헝가리 제1신(8) : 살아 움직이는 역사와 문화의 큰 바다, 부다페스트(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