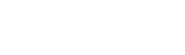아, 백두여! 천지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5-13 16:11 조회 120회 댓글 0건본문
아, 백두여! 천지여!
99년 7월 24일 밤 늦게 연길시내에 도착, 민항호텔(民航大厦)에 여장을 풀었다. 연길은 97년에 이어 두 번째인데, 밤거리가 깜깜한 것은 여전했다. 연변과기대의 이중 부총장께서 사주신 한국음식으로 배를 불린 우리는 연길시의 첫밤을 그냥 보낼 수 없었다. 연변대의 윤윤진교수에게 전화를 넣으니 부리나케 달려나왔다. 윤교수, 한승옥교수, 박종철교수와 함께 택시를 잡아타고 야시장을 돌아본 다음 맥주집에 들러 간단히 목을 축였으나 무언가 미진한 듯 했다. 그러나 내일의 여정을 생각하며 쫓기듯 들어와 안 오는 잠을 청할 수밖에 없었다. 새벽같이 찾아오신 소재영선생님(당시 연변 과기대에 객원교수로 와 계셨으며, 소선생님의 주선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이었다.)의 호령(?)으로 주섬주섬 잠자리에서 일어난 우리는 어제의 그 집에서 아침 요기를 대충 한 다음, 부옇게 밝아오는 연길시를 벗어나 백두산을 향해 출발했다. 더운 날씨와 비좁고 낡아빠진 차 때문에 북경에서 내내 고생한 우리는 한 때 '강택민을 태우고 다녔다는' 차 덕분으로 중국에 온 이후 비로소 편하고 상쾌한 여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연길방송국의 1급 성우로 있는, 한정숙선생(연변대 김동훈교수 부인)이 가이드로 참여해 주셨으니 든든하기가 이루 다 말할 수 없었다. 더구나 한선생은 맛있는 김밥과 토종 참외, 오이 등을 점심과 간식으로 준비해 오는 성의까지 베풀었다. 차 안에서 오이를 먹어보니 어릴 때 시골에서 풀밭에 쓱쓱 문질러 베어먹던 그 오이 맛이었다. 물큰 고향냄새가 풍겨났다.
백두산이 가까워지면서 날씨가 변덕을 부리기 시작했다. 어찌어찌 구름이 걷힐 듯 하다가는 다시 이슬비가 내리고, 원시림 사이사이로는 짙은 안개가 몰려다니고 있었다. 우리는 가슴을 졸이며 하늘을 바라보곤 했다. 나는 이미 97년도의 여행에서 쾌청한 태양빛에 노출된 백두산을 覲參한 입장이긴 했으나,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한 오늘 다시 그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것이다. 그러니 백두산에 처음 오는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떠했으랴?
백두산으로부터 얼마 멀지 않은 이도백하의 중간쯤에서 이른 점심 식사를 한 다음, 길가에서 파는 뱀술도 한 잔 마셨고 북한서 손으로 만들었다는 뼈문구통을 하나 사기도 했다. 물건을 파는 떠꺼머리 총각은 강한 함경도 사투리에 중국어의 억양이 많이 배어 있는 말씨의 조선족이었다. 그는 자꾸만 내 시계를 탐내는 것이었다. 내 시계와 한국돈 몇만원만 주면 그곳에 진열된 도자기(그의 말로는 청대 도자기라고 했으나 믿을 수 없었고, 설사 그렇다 해도 그걸 가지고 공항 검색대를 통과할 자신도 없었다.)를 주겠다는 제의를 해왔다. "마누라가 몇 년간 별러서 생일선물로 사준 시계"라는 말을 하려다가 참고, 나는 그냥 웃어주는 것으로 대답을 대신했다.
불안한 마음으로 축축한 원시림을 뚫고 올라가던 우리의 눈에 드디어 해가 보이기 시작했다. 長白山(중국인들은 백두산을 이렇게 부른다) 산문에 도착하여 입장료를 낸 다음, 30여분을 달려 장백폭포 앞 주차장에 도착하였다. 그곳에서 백두산정에 오르기 위해서는 강한 힘의 지프 로 갈아타야 했다. 산정의 자욱한 안개로 천지의 장관을 보지 못하고 내려오는 관광객들의 투덜거리는 말을 들은 우리 차의 기사는 우리에게 먼저 장백폭포를 구경한 다음 안개가 걷히기를 기다려 올라갈 것을 충고하였다. 장백폭포는 여전히 세찼다. 하얀 포말이 날리고, 태초의 그 목소리 그대로 우레처럼 거대한 골짜기를 울려대고 있었다. 물은 손이 아플 만큼 차가왔다. 그러나 그 물이 흘러내리는 시내의 양편 땅은 부글부글 끓고 있었다. 땅이, 아니 온 산이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언젠간 끓어오르는 내면의 정열을 폭발시킬지도 모른다는 암시를, 끊임없이 마치 주문처럼 외워대고 있었다. 그런데 그 끓는 물의 구덩이들을 중국인들이 차고 앉아, 그 물에 달걀을 삶아 팔고 있었다. 관광객은 모두 한국인들. 우리들의 주머니에서는 쉴 새 없이 돈이 나가고 있었다. 가는 곳마다 장사꾼들이 8월 염천의 파리떼 마냥 덤벼들었다. 천지의 맑은 물이 중국 땅에 떨어져 '장백폭포'로 순백의 포말을 날리는 곳, 그 아래쪽에는 한족, 조선족, 한국인들이 어울려 그야말로 지저분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다.
천지의 물이 장백폭포로 흘러내리는 곳은 아직 나무 하나 키워내지 못하고 있었다. 화산재의 열기가 미처 식지 못했는가, 삼면으로 치올려진 경사면들은 흡사 금방 무너져 내릴듯한 砂質의 흙벽으로 보였다. 그 흙벽들이 모여 이루어진 오목한 곳으로 거대한 물줄기는 흘러내리고 있었다. 거기서 흘러내린 물은 한동안 진행하다가 땅 속으로 사라졌다가 다시 송화강의 본류를 형성한다고 한다. 그러니 이 물이 바로 발해의 고토, 동경성 주변의 비옥한 농토를 만드는 원동력이 아닌가. 장백폭포 입구의 주차장에서 나무숲 너머로 일부만 보이는 폭포와 그 언저리는 흡사 여성의 가랑이와 음부 그 자체다. 그 물이 흘러 곡식을 키우고 나무와 풀을 키우며 많은 사람들의 목을 축여주니, 이곳에서 뿜어대는 물이 풍요와 생산력의 근원임을 확인하는 순간이었다.
11시쯤 우리는 지프에 올라타고 정상으로 향했다. 경사진 길의 울퉁불퉁한 노면만큼이나 난폭한 운전자의 손놀림에 섬뜩해진 가슴을 길가에 널려 있는 하?고 노란 들꽃들과 돌멩이들의 정겨운 모습을 보며 달랠 수 있었다. 30여분만에 간신히 도착한 밋밋한 평원에는 기상관측소인지 관리소인지 알 수 없는 건물이 납작 엎드려 있고, 그 아래로 여러 대의 차량들이 주차해 있었다. 정상에 떠도는 안개와 구름을 바라보며 불안한 마음을 안고 우리는 100여미터를 걸어 올라갔다. 거의 도달했을 즈음, 갑자기 위에서 함성과 박수소리가 터져나왔다. 아, 천지에 가득 잠겨있던 안개가 바야흐로 실실이 풀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검푸른 물 위로 안개가 비실비실 움직이며 하늘 높이 날아 오르는, 천지의 광경이야말로 신비 그 자체였다. 저 물은 어디서 오는 것이며 저 속엔 무엇이 들어 있는가. 폭포를 보았으니 빠져나가는 곳은 알 수 있겠으나 그 오는 곳은 과연 어디인가. 맘에 들면서도 약간 삐딱하게 느껴지는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의 저자는 그 책에서 "백두산 천지를 두고 수많은 미사여구로 민족의 위대함을 노래하는 자아도취는 결국 시선을 백두산 천지에 모두 빼앗기고 만다는 측면에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보아야 할 논조들이다. 산을 가다보면 산이 있고, 산이 있다보니 폭포도 있고, 호수도 있음이 무에 그리 넋을 놓고 노래하며 민족 장래 모두를 부탁할 만큼 대단한 것이던가? 그것은 백두산 아랫마을 이도백하의 시장 언저리에서 더덕 몇 뿌리를 천년 묵은 약초라고 팔고 있는 허술한 장사꾼의 보따리만큼이나 우스꽝스런 몸짓들이다" 라는 기상천외의 말을 늘어놓고 있다. 백두산에게 민족의 장래 모두를 부탁한 사람이 있었는지 나는 아직 모르겠으되, 이 글의 생각처럼 메마르고 멋없는 경우는 세상에 없다. 누구의 말대로 산이 거기에 있으니 오르는 것이고 올라본 다음에는 느낌이 중요한 것이거늘, 어찌하여 그 물과 돌, 흙의 성분까지 분석해야 한단 말인가. 재주도 좋지 천지가 내려다 보이는 산 정상에 '어떤 놈'인가 똥까지 두어 무더기 싸놓긴 했더라만, 금방 죽어 공중에 흩어질 인간들이야 저 영겁을 두고 그냥 그 자리에 검푸르게 남아 있을, 위대한 자연에 비할 때 과연 무어란 말인가. 어째서 바야흐로 안개가 걷히면서 드러내는 천지의 이 모습, 이 물이 생명의 원초가 아니란 말인가. 가증스러우리만큼 편협하고 얕은 인간의 知力과 마음으로 어찌 대자연의 마음에 범접이나 할 수 있으리요?
지난번에 카메라 조작 실수로 필름을 송두리째 날려버린 나는 이번에야말로 저 신비로운 모습을 확실히 담아두리라 마음 먹으며 열심히 찍어댔다. 천지의 모습을 찍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담고 싶었다. 부박하기 짝이없는 유물론자들이야 뭐라고 떠들어대든 나는 천지가 내게 들려주는 말을 분명 들을 수 있었다. 백두산 정상에서 발견한 똥무더기와 그 언저리를 맴도는 파리들은 분명 자연으로부터의 업보를 자초하게될 원죄의 상징이며, 더럽고 하챦은 인간의 본질을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또 하나의 記號였다. 백두산의 끓는 정열에 달걀을 삶아 팔고, 그것을 사먹는 우리 인간들은 백두산의 우렁찬 경고를 듣지 못하고 있었다. "머지 않아 천지의 원초적 생명수가 흘러넘쳐 인간의 모든 배설물들을 정화시키리라, 그리고 그 정화된 대지 위에 새로운 생명의 싹을 키우리라"고 외치는 백두산과 천지의 웅장한 포효를.
* 사진을 첨부하였습니다. 위의 내려받기에서 압축된 파일을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2002-06-27
첨부파일
- backdusan.zip (4.1M) 12회 다운로드 | DATE : 2021-05-13 16:11:44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