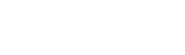공공장소의 과일나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5-13 17:05 조회 178회 댓글 0건본문
공공장소의 열매들을 따지 말자
언젠가 어떤 학회에서 답사를 간 적이 있었다. 고궁 터에는 살구가 보암직하게 열려 있었다. 그걸 보자마자 교수들도 박사들도 우르르 달려 들어 낄낄대며 마구 흔들어댔다. 어른들의 행태를 목격한 학생들도 덩달아 나섰다. 그러나 그들은 아직 덜 익어 시금털털한 열매들을 몇 개 씹어보곤 내동댕이쳤다. 바닥에는 익다 만 살구들이 허옇게 널려 있었다.
또 다른 답사회에 합류하여 동해안 북단을 다녀온 적이 있었다. 그곳 뽕나무들엔 오디가 불긋불긋 익어가고 있었다. 노소를 막론하고 아줌마 아저씨들은 낄낄대며 뽕나무를 마구 흔들어댔다. 불쌍한 오디들은 익기도 전에 그들의 우악스런 손아귀에 짓이겨지고 말았다.
몇 년 전의 일일 것이다. 종로 어디쯤 길가에 사과나무(감나무인지도 모른다)를 심었다는 보도를 접한 기억이 있다. 삭막한 서울의 중심가에 주렁주렁 열매들을 달고 있는 과일나무를 상상해보라. 그것만으로도 가슴 뜨거워지는 일 아닌가. 그런데, 얼마 후 한 알도 남아 있지 않은 과일 나무의 보도 사진을 보게 되었다. 눈으로 보면서 마음의 풍요를 느끼는 단계까지 우리의 의식은 높아지지 못했던 것이다.
5년 전쯤인가, 미국에 잠시 머물 기회가 있었다. 그곳에서 학교나 거리의 유실수에 매달린 열매를 건드리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그것들이 빠알갛게 익어 떨어질 때까지 따내려는 사람이 없었다. 간혹 다람쥐나 청설모, 까마귀 등이 찾아와 먹이로 삼을 뿐이었다. 심지어 나중엔 지난 해의 열매를 매단 채 새로이 꽃을 피우는 모습까지 볼 수 있었다. 신기하고도 부러운 광경들 중의 하나였다.
내가 봉직하는 대학의 캠퍼스는 좁지만 아름답다. 잘만 가꾼다면 어느 대학 못지 않을 환경이다. 누가 심었는지 모르지만, 언제부턴가 유실수들이 제법 자라고 있다. 매화, 복숭아, 모과, 감, 은행, 꽃사과, 등등. 꽃 피고 열매 맺고 익어가는 과정에서 내 마음을 흐뭇하게 해준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지금까지 이곳에 재직해오는 십수년 동안 그것들이 나무에 매달린 채 빨갛게 익어가는 모습을 본 적이 없다. 대부분 외부인들의 행위로 보이지만, 대학 내에도 그런 짓을 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는 소문은 나를 대단히 실망시키고 말았다. 대학 역시 우리나라의 안에 있는 작은 공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하곤 했다. 건물 짓고 청소하는 것만으로 학교 당국의 임무가 끝나는 것은 아니다. 교정의 나무에 매달린 과일 하나 제대로 간수하지 못한대서야 말이 되겠는가. 최소한 학교의 관리를 맡은 사람들만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교육을 시켜야 할 것이다.
나는 지독한 촌놈이다. 그리고, 너나없이 못 먹고 헐벗던 시절을 ‘깡촌’에서 보냈다. 집 근처에 뿌리박고 있던 쇠복숭아, 개살구 등 배고픈 우리들의 공격 목표는 꽤 많았다. 그 뿐인가. 등하굣길 친구들과 어울려 산판을 헤매며 각종 열매들을 따먹곤 했다. 등하굣길에 가게에 들러 군것질을 하는 요즈음 아이들처럼 말이다. 앞에서 ‘낄낄대며’ 과일나무를 사정없이 흔들어대던 그들 역시 나와 같은 성장과정을 거쳤을 것이다. 그러니, 어디에 서 있든 과일나무만 보면 달려가 ‘낄낄대며’ 따낼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닌가.
그러나, 백보를 양보해도 지금 배 고파서 교정의 열매들을 따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시장에 가보라. 싼 값의 잘 익은 과일들이 산처럼 싸여 있지 않은가. 그럼에도 왜 우린 채 익지도 않은 교정의 과일들을 무자비하게 짓씹어 버려야 하는가. ‘다 익은 걸 남 주느니 차라리 내 손으로 버리자’는 심보인가. 공부에 지친 머리와 몸을 쉬기 위해 나무에 앉아 익어가는 열매를 바라보는 즐거움을 대학인들로부터 앗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란 말인가. 아직도 우리는 못 먹어 배 고프던 시절의 행태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학교의 비품을 도둑질하는 일이나 교정과 길가의 열매를 마구 따가는 행위는 같은 일이다. 아니,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게 열매라는 점에서 교정이나 길가의 열매를 따는 행위는 비품의 절도보다 더 못된 행위다. 이젠 우리의 수준을 높여야 할 때다. 공공 장소의 나무 열매가 지닌 정서적 가치•미적 가치에 눈을 돌리고, 보면서 즐기는 수준으로 높아져야 할 때다.
2003. 11. 5. 백규 씀
2003-11-05
첨부파일
- 긴급제언_교정의_열매를_따지_말자.hwp (21.0K) 15회 다운로드 | DATE : 2021-05-13 17:05:3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