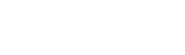아, 발해여! 경박호의 석양이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5-13 16:15 조회 117회 댓글 0건본문

-중국기행 제 2탄-
아, 발해여! 경박호의 석양이여!
7월 26일 새벽 연길의 숙소를 출발, 드디어 발해의 고토(故土)를 밟는다.
어제 밤 늦게 호텔을 찾아온 김동훈교수와 잠깐 동안의 논전을 벌인 바 있는 나는 감회가 더욱 새롭다. 그날 밤 그는 비아냥거리듯 말했다. 발해가 어찌 조선민족의 나라냐고. '무수한 민족이 거쳐간 그곳이거늘 어찌하여 유독 한국사람들만 자신들의 연고지인양 법석대느냐'는 힐문이었다. 대조영도 고구려의 유민이긴 했으나 출신 민족이 불확실하다는 것이 그가 제기한 첫 번째 문제였고, 발해 역시 당나라가 대조영을 '발해군왕'에 봉함으로써 국가적인 실체를 비로소 인정받았다는 것이 두 번째 문제였다. 그렇다. 그곳에서 웅거했던 나라가 어찌 발해 뿐이었으리오. 그러나, 대조영이 건국 초기에 자신의 나라를 '진국(震國)'이나 '고려(高麗)'로 자칭하면서 고구려의 계승자임을 분명히 한 것이 역사의 기록에 나타나며, 고구려 멸망 이후 당나라가 평양에 세운 안동도호부 마저 사라진 이후 요동을 중심으로 고구려의 유민들이 소고구려국을 세운 사실 또한 역사에 뚜렷하다. 더구나 안동도호부가 쇠망해갈 무렵 요서지방의 요충인 영주(營州)에서는 당의 압제에 시달리던 거란족이 반란을 일으켜 이 지역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었다. 이 무렵 고구려 멸망 후 이곳에 이주해오던 고구려 유민들과 함께 말갈인들이 대조영과 걸사비우(乞四比羽)의 지도로 거란족에 의해 혼란에 빠진 영주를 빠져나와 만주방향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당군의 저지를 받게 되고, 연이은 전투에서 걸사비우가 죽자 대조영은 말갈인들을 거느리고 당군의 추격을 물리치면서 동만주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다. 698년 당시 계루부(桂婁部)의 옛 땅인 길림성 돈화현(敦化縣) 육정산(六頂山) 근처에 성을 쌓고 나라를 세워 진국이라 하였다. 지금 남아있는 오동산성(敖東山城)과 성산자산성(城山子山城)이 바로 그 유허(遺墟)인 것이다. 이래도 대조영이 고구려인이 아니라 할 것이며, 우리가 발해에 대한 연고권을 주장해선 안된다는 말인가. 김동훈교수는 논전의 말미에 간청하듯 말했다. 제발 한국인들이 발해땅에 가서 호들갑을 떨지 말라는 것이었다. 이유인즉 그럴수록 중국의 중앙정부에서 중국내 조선족에 대한 감시의 눈초리만 더 강화된다는 것이었다. 사실, 중국 정부가 만주 일대의 문화재나 역사적 의미에 대한 우리나라 학계와 정계의 지나친 관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점은 이미 들어 알고 있는 나로서는 굳이 그런 말에까지 토를 달 이유는 없었다.
바로 그곳을 가게 된 것이다.
해 뜨기 전에 서둘러 아침을 먹고 길을 나섰다. 멀기도 하려니와 우선 길바닥이 엉망이었다. 염천하에서 여러날 여행에 지친 몸들이라 대단히 고달팠다. 차는 자갈길을 전속력으로 달리는 경운기마냥 마구 튀었다. 다행히 김동훈교수 부인께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한 덕분에 그럭저럭 노독을 달랠 수는 있었다. 예닐곱 시간을 족히 달려 점심참도 지날 즈음에서야 동경성의 발해 고토에 닿았다. 미루나무 늘어선 한적한 길가에 차를 세우고 김밥으로 허기를 지웠다. 바로 옆에는 벼가 무성히 자라고 있는 들판이 끝간 데 없이 펼쳐져 있었다. 아, 이 들판. 바로 내가 어릴적부터 자라오던 그 시골구석의 들판 바로 그것이었다. 돈화현에 들어오면서는 왜 그리 푸근한 느낌이 드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는데, 이곳 들녘을 보고 나서야 바로 내 고향에 온 느낌의 근원을 깨닫게 되었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이곳은 전통적으로 고려인들이 집단적으로 몰려 살아온 지역이라 한다. 그것에 위기를 느낀 중국의 정부가 한족들을 대대적으로 이주시켜 지금은 오히려 한족들의 숫자가 더 많아졌다는 것이었다. 말하자면, 민족의 분포상으로 보아도 발해가 분명 우리 민족이 세운 나라였고, 중국 정부도 그런 점을 내심 인정하고 있었던 것일까? 어쨌든, 논농사의 형태나 관개의 방법, 논두렁의 형태 등이 전통적인 우리의 그것들과 흡사했다. 비로소 나는 한국사람들이 중국에 오면 왜 반드시 이곳 발해의 고토를 밟아 보고자 하는가, 그 이유를 깨달을 수 있었다.
점심 후 우리는 '발해왕도 상경성 터'를 밟아 보았다. 입구에 '발해국상경용천부유지(潑海國上京龍泉府遺址)'라는 큰 비석이 세워져 있고, 좀 더 들어가니 초라한 관리소 앞으로 '발해국간개(潑海國簡介)'와 '발해왕도상경성지간개(渤海王都上京城址簡介)'라는 입간판이 서 있었다. 그곳 관리소에서는 한족 노파가 무어라고 지껄이며 우리를 제지하였다. 몇푼 돈을 집어주자 들여보내주고, 우리를 '고정(古井)'이란 글자가 쓰여져 있는 우물로 안내하였다. 물을 떠 마셔보라고 인심 쓰듯 두레박을 내미는데, 그 또한 돈을 달라는 제스쳐임에는 예외가 없었다. 내심 우리의 옛 궁터를 지키는 사람마저 조선족이 아닌 한족을 배치하고 있는 중국 당국의 주도면밀한 계산성에 불쾌감을 느끼면서도 어쩔 수 없었다. 배터지게 물을 마신 우리는 무너져가는 성벽을 쓸어가며 성 안으로 들어갔다. 온통 잡초 가득한 속에 군데군데 주춧돌들만 늘어서 있었다. 그 옛날 고려의 원천석(元天錫)이 은거지 원주 치악산으로부터 망해버린 개경에 돌아와 읊었다는 <회고가>를 떠올릴 수밖에 없었다. "흥망(興亡)이 유수(有數)하니 만월대(滿月臺)도 추초(秋草)로다 오백년 왕업(王業)이 목적(牧笛)에 부쳤으니 석양에 지나는 객(客)이 눈물 겨워 하노라" 고 했다던가. 만일 원천석이 이곳에 왔다면, 어쩌면 피눈물을 쏟았겠지?
<선구자>의 시인 윤해영 또한 <발해고지(渤海古址)>란 시를 남겼다.
오월의 석양
발해 옛터에
집팽이와 나와
풀숩에 스다
역사란 모도다
거짓말 갓태서
육궁의 남은 자최
줏추들도 늘것는데
제일궁지 드놉흔곳
응령사 종이 울어 울어…
기와 편편 어루만저
회고에 잠기우면
저-- 언덕 밧가는 농부
그 시절 백성인 듯
멍에 민 소장등에
태고가 어리우다
이 얼마나 절절한 회고의 심정이냐!
어쨌든 주춧돌만으로도 그 궁궐의 위용은 대단했다. 나란히 남아있는 수백의 주춧돌들은 거대한 회랑의 열주(列柱)들임에 틀림 없었다. 그런 엄청난 회랑으로 연결되는 건물들의 위용을 생각하며 한동안 마음이 착잡했다. 더구나 엄청나게 큰 돌들을 쌓아올린 다음 그 위에 주춧돌을 놓고 기둥을 올렸으니 건물의 높이 또한 대단했으리라. 그런데 그 돌들을 과연 어디에서 가지고 왔는가가 의문이었다. 아무리 둘러보아도 평평한 농경지 뿐인데 구멍이 숭숭 뚫린 이 엄청난 크기의 화산석들은 과연 어디에 있었단 말인가. 알 수 없었다.
발해성터를 나온 우리는 동경성 시내 쪽으로 나오다가 도교사원과 발해의 흔적을 지니고 있음직한 불교 사찰을 방문했다. 모셔놓은 부처와 보살들, 공자, 도교의 종사들 모두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들이었다. 뿐만 아니라 무격의 사원에는 우리나라 아주머니나 할머니들의 모습을 한 신들을 모시고 있었다. 흥미로운 일이었다. 그곳에서 아쉬웠던 일은 일정상 정효공주묘(貞孝公主墓)를 가보지 못한 일이다. 돈화시의 육정산 고분군에는 80여기의 무덤들이 있고, 이 가운데 32기의 무덤이 발굴되었다 한다. 1949년 이곳에서 정혜공주(貞惠公主)의 무덤이 발견됨으로써 이 고분군이 발해 초기 왕실과 귀족들의 무덤이라는 점이 확인되었다 한다. 특히 서고성 근처 허릉현의 용두산 고분군에서 1980년 정효공주의 무덤이 발굴됨으로써, 이 고분군에 있는 10여기의 무덤들도 발해 왕실이나 귀족의 무덤들임이 확인되었다는 것이다.
아쉽긴 했으나 바쁜 일정 때문에 꿈에 그리던 경박호로 달렸다. 925년 12월말부터 다음해 1월초에 걸친 거란왕 야율아보기(耶律阿保機)의 공격으로 별다른 저항도 해보지 못한 발해의 마지막 인선왕이 대대로 전해오던 거울을 안고 이곳으로 달려와 이 호수물에 뛰어들어 죽었다던가. 그래서 이 호수의 이름이 경박호(鏡泊湖), 즉 '거울이 빠진 호수'란다. 슬픈 유래에 비해 호수는 아름다웠다. 호수를 둘러싼 우거진 숲들 사이로 중국식 별장들이 저마다 자취를 뽑내며 서 있는 모습. 아, 중국도 이제 더 이상 사회주의의 보루가 아님을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북경 시내에서 수없이 목격한 민간인들의 벤츠 자동차 뿐 아니라, 이젠 돈만 있다면 얼마든지 경박호를 내려다보며 별장을 세울 수도 있게 된 것이다. 경박호에서 뱃놀이를 즐기는 그 많은 인파는 이제 중국인들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었다. 우리는 배를 타고 호심(湖心)을 가로지르며 해지는 경박호를 감상하기로 하였다. 나는 넘어가는 해를 등진 경박호의 선상에서 일제시대 이 지역에서 문명을 날리던 대 시인 이욱(李旭)의 <경박호>를 나직히 읊조렸다.
호구(湖口)가 나팔(喇叭)처럼 틔어서
뽀얀 안개를 먹음고
빨간 놀을 토(吐)하오
구릉(丘陵) 뒤 밀림(密林)에는
천년전설(千年傳說)이 물드렀고
노흑산(老黑山) 푸른 이끼에
임포소(林布素)장군 넋이 스미었소
송을령(松乙嶺) 마루에
영란(鈴蘭)이 곱고
장가향(張家鄕) 섬과 섬에
두루미 날고
푸른 물낯에
은린(銀鱗)은 뛰어도
대묘령(大廟嶺) 허리에는
부처 꿈이 깊소
삼령둔(三靈屯) 왕릉(王陵)에
달빛도 처량한데
진주사(眞珠砂) 알알에
눈물이 아롱지오
사계통(四季通) 오르나리는 배는
오늘도 말없이 금거울 찾건만
노부(老夫)의 고혼(孤魂)은 흑진주에 숨은 채
반백척(半百尺) 조수루(弔水樓)에
낯낯이 옥쇄(玉碎) 되오.
이 시 속에 스며 있는 발해의 슬픈 역사와 시인의 감상이 바야흐로 떨어지는 태양에 오버랩되면서 젊은 나그네의 마음에 안개가 서리는 듯 했다. 컴컴해질 무렵, 우리는 하릴없이 경박호를 하직하고 동경성으로 다시 되돌아와야 했다. 숙박시설이 마땅치 않았고 더위에 지쳐있던 터라 우리는 좀더 쾌적한 잠자리를 찾을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말 그대로 대륙이었다. 가도가도 끝이 없는 들판의 연속이었다. 저 들판. 우리의 조상들이 잘만 간직해주었어도 지금쯤 우리는 중원을 호령하고 있지 않겠는가. 못난 놈 조상탓한다는 옛말을 모르는 것은 아니로되, 중국을 돌아다니며 잘난 조상들 탓에 무제한의 관광수입을 올리는 중국인들이 마냥 부러울 뿐이었다. 길가에서 중국돈 10원 안쪽으로 산 수박을 깨먹으며 한밤이나 되어서야 우리는 칠흑같은 동경성 시내로 들어올 수가 있었고, 에어컨 가동되는 호텔(?)을 찾다 지친 우리는 간판이 그럴 듯한 '동방대주점(東方大酒店)'에 여장을 풀었다. 중국에는 가는 곳마다 '주점(酒店)'이나 '반점(飯店)'이란 명칭의 엄청난 간판들을 볼 수 있는데, 처음에는 '술집 한 번 되게 크군'이라고 놀래었으나 나중에 그것이 호텔의 중국식 명칭임을 알게 되었다. 간판에 비해 시설은 형편 없었다. 2인이 쓰게 되어 있는 객실은 말만 방이었다. 양쪽으로 마루 비슷한 것을 높여 놓고 이불과 베개만 덩그렇게 놓여 있었다. 화장실이 문제였다. 재래식 화장실 하나를 한 층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사용해야 했다. 물사정은 여기도 마찬가지였다. 도대체 저 넓은 들판을 구비구비 흘러가는 송화강의 엄청난 물은 어디에 다 쓰는지, 호텔이라는 곳의 화장실에 물이 잘 나오지 않아 똥무더기가 그대로 변기에 남아 있곤 했다. 1층의 식당에서 중국음식으로 허기를 달랜 우리는 2층에서 울려대는 노래방의 소음을 자장가 삼아 겨우 한 밤을 때우고 말았다.
아침에 일어나 시내를 내려다 보았다. 바로 60년대 시골의 소읍을 바라보는 듯, 거리는 한산했고 지저분했다. 가끔 덴뿌라(?) 장수나 물고기 장수, 두부장수 등이 정적을 깰 뿐 지저분한 차림의 사람들만 몇몇 나다닐 뿐이었다. 호텔 바로 앞에 술집도 있었는데, 어제밤에 알았다 해도 아마 피곤하여 가지 못했을 것이다.
1박 2일로 발해고적, 경박호, 동경성을 돌아나오며 나는 과거와 현재의 분명한 단층을 느꼈다. 과거는 현재 속에 용해되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 이곳을 거치면서 나는 역사란 문헌으로 확인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느꼈다. 내 피 속에 용솟음치는 한 줄기 감상이 바로 기록되지 않은 역사의 씨줄이요 날줄이 아닌가. 내 피의 속삭임을 마음 깊이 갈무리해 두고, 그 기억을 대물림해가다보면 그 속삭임이 언젠간 웅혼한 포효로 바뀔 날도 있으리라. 나는 발해국 유허에서 유적을 발굴하는 모습을 카메라에 담던 우리에게 핏대를 세우고 달려드는 한족 관리의 못난 컴플렉스를 기억한다. 아니 오래도록 기억하기로 했다. 언젠간, 그런 것들이 폭포수처럼 이 민족의 오지랖으로 안겨들어올 날이 있으리라. 끈질기게 기다릴 일이다.
* 사진을 첨부하였습니다. 위의 내려받기에서 압축된 파일을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2002-08-08
첨부파일
- balhae.zip (2.0M) 12회 다운로드 | DATE : 2021-05-13 16:15:0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