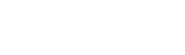아, Death valley! 그 영원한 삶을 잉태한 죽음이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5-13 16:16 조회 127회 댓글 0건본문

아, Death valley! 그 영원한 삶을 잉태한 죽음이여!
김형!
처절한 죽음을 통해서만 진정한 삶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느꼈거나 목격해본 적이 있소? 아니면 죽음의 두꺼운 껍질 속에서 內燃하는 생명의 소리를 들어본 적이라도 있소?
나는 분명 보았고, 느꼈소. 억겁의 침묵 속에서 생명의 용광로를 안으로 안으로만 달구고 있는 죽음의 실체를. 그것은 윤회와 운명의 한 부분이었고, 오만한 인간에게 삶의 섭리를 보여주려 신이 베풀어 놓은 거대한 전시물이기도 하였소. 윤회라니 무슨 당치도 않은 말이냐구요? 그렇지 않습디다. 분명 삶과 죽음,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모습이 한 고리에 얽혀서 돌아가는 모습을 나는 그 응축된 실체들 속에서 느낄 수 있었소. 언젠가 꽃과 나무, 풀들이 뿌리 내려 삶의 아름다움을 구가할 그 날을 그 죽음 속에서 확실히 읽어냈단 말이오. 계곡과 바위틈을 휘젓고 내려달리며 살아 있는 모든 것들의 숨결을 잠재우는 거센 열풍의 포효는 죽어있는 밸리의 재생을 예고하는 위대한 메시지임에 틀림없었소. 그 열풍 속에 즐비하게 늘어서 있는 봉우리들과 바위산들은 그저 인고의 수행자들인양 말없이 고개 숙인 채 자신들에게 주어진 운명을 달게 받아들이는 모습들이었소. 나는 오랜동안 관념 속에서만 캘리포니아 중동부 지역을 깔고 앉아 있는, 엄청난 자연의 이단자를 그려왔었소. 자연이란 생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오? 그런데 생명을 잉태한 죽음 자체도 자연의 큰 부분이란 사실을 비로소 깨달은 것이오.
4월 25일 아침 6시. 우리는 설레는 마음으로 장도에 올랐소. LA의 서부로부터 405번→5번→14번→190번 등의 프리웨이를 갈아타면서 우리는 황량하게 변해가는 자연의 모습에 불안감과 깨달음을 동시에 가질 수밖에 없었소. 끝없이 펼쳐지는 황량한 사막들은 거센 모래바람과 함께 자그마한 이방인에게 두려움의 침묵을 강요하고 있었소. 바로 그곳이 그 유명한 Amargosa Desert이고 Grapevine Mountains의 줄기이기도 하였소. 어느 만큼 달리자 거대한 소금벌판이 나타났고, 자욱한 소금의 안개 또한 그 벌판을 누르고 있었소. 소금의 안개 위로는 뜨거운 태양이 이글거리고 있었는데, 그 때문인가 가련한 풀들은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 그 푸른 꿈을 안으로 안으로만 삭히고 있는 듯 했었소. 그런데 이게 웬 일이요? 그 소금의 왕국에 글쎄 거먹소들이 무리지어 살고 있는 것이었소. 도대체 무슨 운명들을 타고 났길래 이 모진 땅에 태어나 살아간단 말인가? 나는 할 말이 없었소. 그 큰 몸집의 까만 소들이 삼삼오오 무리 지어 느릿느릿 움직이고 있었소. 마침 그 때가 물 마시는 시간이었던가요? 이들이 서너마리씩 무리를 지어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길을 건너려 하고 있었소.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은 이들이 분명 무슨 말인가를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길 넘어 멀리 보이는 호수(소금물의 호수?)로 향하고 있더란 말이오. 내 차가 속력을 줄이니 그들도 일단 멈춰 섭디다. 우리를 멀건히 바라보면서 말이오. 나도 그들을 의식하고, 그들도 나를 의식하면서 잠시 우리는 서로의 의중을 탐색하고 있었던 것이오. 忍苦의 철학을 체득한 듯한 그들에 비해 한 없이 가벼운 존재인 내가 먼저 그곳을 뜰 수밖에 없었소. 세상에, 그 땅에는 소들마저 교통질서를 잘 지키는 듯 하더군요. 우리가 지나고 나자 그들은 일제히 우리쪽에 시선을 주면서 무어라 중얼거리며 길을 건너더군요.
소금의 벌판을 벗어나서 험한 산등성이 몇 개를 힘차게 오르락내리락 하던 우리는 갑자기 나타나는 거대한 분지에 넋을 잃어버렸소. 얼마나 거대한 용암이 휩쓸고 지나갔으면 그 높고 큰 산이 푹 파이고, 새까맣게 탄 돌맹이들이 저리도 처참하게 널부러져들 있을까? 그 계곡 사이로 태고의 바람은 사정없이 웅웅거리고 있었소. 우리를 날려버릴 듯한 바람은 분명 그 계곡에서 만들어지고 있었던 것이오.
데쓰밸리에 도달하기도 전에, 영혼을 흔들었을 천지창조의 굉음과 태고의 적막에 우리는 압도당하고 말았소. 간신히 몸과 마음을 추스려 가던 길을 내쳐 달리기 시작했소. 분지의 밑바닥은 겁나게 넓고 황량한 벌판이었소. 거 왜 있지 않소? 바닷물이 빠진 서해안. 뻘건 나문재풀만 깔려 있고, 그 사이로 소금끼 하얀 진흙이 희끗희끗 내보이는 곳 말이오. 그 바닥은 바로 그 굳어진 개펄입디다. 그 순간 나는 묘한 착각을 하게 되었소. 흡사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열탕의 바다 밑을 지나고 있다는 느낌 말이오. 이곳의 이름이 무언지 아시오? 바로 Mud Canyon이었소. 그리고 머드캐년의 입구가 바로 Hells Gate 즉 지옥의 문이었소. 알만 하지요? 전속력으로 한동안 달리고 나니 가파른 고갯길이 나옵디다. 만약 차가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어쩌나 하고 불안해 하면서 정말 힘들게 달려 올라갔소. 가도가도 끝이 없는 길이었소. 초보시절 처음 차를 몰고 대관령이라는 델 가면서 느꼈던 두려움과 지겨움. 그러나 여긴 아름다운 대관령이 아닌 황량한 돌산에 규모 또한 대관령의 10여배는 족히 됩디다. 그러니 알만 하쟎소? 겨우겨우 넘어가니 길은 비스듬히 내리막으로 끝도 없이 뻗어가는 것이었소. 말하자면 고개 넘기 전에 거쳤던 그 바다밑보다도 훨씬 더 깊이 잠겨드는 것 같았소. 드디어 데쓰밸리에 도착한 것이오.
엄청난 곳이오. 이 계곡은 남북의 길이 225㎞, 동서의 길이 8∼24㎞에 달하며 해수면보다 110m 이상 낮은 곳도 있었소. 우리는 모랫바람 날리는 Stovepipe Wells Village의 한 모텔에 묵게 되었소. 우리가 도착한 시각은 오후 1시. 4시부터 첵크인할 수 있다고 하길래 매니저 노릇을 하고 있는 노파에게 트렁크에 가득 실은 짐이라도 부려놓으면 안되겠냐고 사정을 하니 표독한 얼굴로 일언지하에 "absolutely not!"하고 외치는 것이었소. 여기나 거기나 사람 살기 힘든 관광지 인심은 마찬가지인 듯 싶었소. 괜히 예약할 때 내 편에서 친절하게 굴었구나 생각하니 심통이 나기도 했지만 할 수 없었소. 하는 수 없이 짐(주로 먹을 것)을 바리바리 실은 채 관광에 나설 수밖에 없었소.
이 마을에는 슬픈 유래가 있습디다. 아시오? 서부개척시대의 일, Gold Rush를 말이오. 엄청난 부의 환상을 가득 안고 동부로부터 오던 사람들은 1849년 이곳을 통과하며 엄청한 고통을 겪었던 모양이오. 그들이 타고 오던 마차가 더 이상 넘을 수 없는 곳 아니겠소? 우리가 차로 달려온 그 Grapevine Mountains가 어디 예사로 험준한 곳이오? 그러니 말과 마차가 더 이상 쓸모 없었겠죠. 그래서 이곳에서 마차를 버리고, 말을 잡아 마지막 파티를 벌였던가 보오. 그들을 이곳에서는 49ers(fortyniners)라고 부르는 모양이오만. 등불을 따라 몰려드는 부나비처럼 황금을 쫓아 몰려드는 허무한 인간군상의 상징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겠소? 그 마차의 잔해들이 아직도 보존되어 있고 Burned Wagon Point라는 제목의 기념비가 그 당시의 마차바퀴로부터 호위를 받으며 서 있더군요.
촌각이 아쉬운 우리는 즉시 길을 나섰소. 우선 모텔로부터 20여분을 달리니 Furnace Creek Visitor Center, Furnace Creek Ranch, Borax Museum 등이 나오더군요. 박물관에 들러 이 지역의 역사와 유물들, 관광 포인트 등을 익혔소. 그런 다음 종려나무 우거진 그곳 캠프그라운드의 시냇가에 앉아 준비해온 음식으로 시장끼를 때웠지요. 그 맑은 물과 나무숲, 참으로 인상적이었소. 그냥 떠서 마시고 싶은 충동이 날만큼 맑았소. 말하자면 그곳은 데쓰밸리의 오아시스인 셈이었소. 점심 후 우리는 부글부글 끓는 길을 달려 Bad Water라는 델 갔소. 그저 무엇엔가 '오염된 물'만 한 바닥 그득 고여 있으려니 기대한 나는 그냥 경악하고 말았소. 아, 끝없이 펼쳐진 소금밭. 그건 우리가 알고 있던 서해바다의 염전이 아니었소. 넘실대는 바다가 억겁 따가운 햇볕에 시달리다가 결국 하얗게 소금으로 변해 손 들고 일어서 있는 곳. 지독한 소금의 광야였소. 발로 비벼보니 아직도 물기는 남아 있습디다만, 여하튼 소금천지를 나는 보았소. 그 드넓은 소금 벌판 사이로 아직도 흘러내리는 물길은, 글쎄요 그 속에 무슨 생명이라도 깃들어 있었을지요?
Bad Water와 이웃하고 있는 곳이 바로 Devils Golf Course라는 곳이었소. 이곳이 바로 해수면보다 110m나 낮은 곳이오. 이곳이야말로 엄청한 소금밭이었소. 참, 미국사람들도 이름을 지어내는 걸 보면 우리 못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소. 악마들이 골프를 칠 만한 곳 쯤으로 생각한 모양이오. 그곳에 도착하기 까지 중간에서 만난 Mustard Canyon, Mushroom Rock 등은 얼마나 그럴 듯 하오? 캐년을 이루고 있는 바위들이 머스터드를 발라놓은 듯 노오란 색을 띠고 있었소. 길 가에 오도마니 서 있는 바위는 모양이 흡사 버섯 같았는데, 왜 있쟎소? 우리나라에도 용두암이니 모자바위니 촛대바위 등 곳곳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연상작용이 만들어낸 바위들 말이오. 어쨌든 그들도 골프, 머스타드, 버섯 등 자신들이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사물들이 그래도 친숙한 듯 그런 이름들을 붙여 놓았습디다. 우리나 그네들이나 그런 점에서 기본적인 생각이나 느낌이야 같지 않겠소? 한동안 소금바다에서 헤매던 우리는 Twenty Mule Team Canyon을 들렀소. 가파른 언덕의 중반 쯤에 주차한 다음 우리 네식구는 뜨거운 태양을 등지고 캐년을 트레킹하게 된 것이오. 그런데 거대한 바위틈으로 군데 군데 구멍들이 뚫려 있기도 하고, 높은 산에 오를 수 있는 틈이 생겨 있기도 했소. 놀라운 건, 우리가 걸어 올라가는 양 옆의 바위 벽에는 억겁 세월 물에 씻긴 흔적들이 제각각 아름다운 자태를 뽑내고 있다는 점이었소. 그 뿐이었겠소? 참으로 감격스러운 광경은 그 메마른 대지에서도 이름 모를 어떤 잡초는 꽃을 피워가지고 서 있었소. 참으로 아름다운 꽃이었소. 그 식물은 동양으로부터 온 어떤 이방인들을 기다리고나 있었던 듯, 고즈넉한 표정으로 우리을 반기는 것이었소.
나는 흡사 우리가 물 속을 헤엄쳐 올라가는 물고기들이라는 착각을 하기도 했었소. 갈라진 틈을 비집고 석산을 오르다가 지쳐 내려와 그곳으로부터 가까운 곳에 있는 Artist Drive를 달리며 색다른 풍경들을 접하게 되었소. Artist Palette라면 대충 무슨 뜻인지 아시겠지요? 경이롭게도 암석군들마다 제각각의 색깔들을 뽐내며 흡사 팔레뜨처럼 총천연색의 장관이 펼쳐져 있었소. 제각기 다른 암석의 성분들이 햇빛을 받아 다양한 색깔을 연출했던 것이오. 미국인들의 命名術이 기막히다고 생각하며 서부개척시대의 생생한 역사적 유물, Keane Wonder Mine and Mill Ruins에 들렀소. 말하자면 금을 채굴하고 제련하던 유적과 유물들이 그곳에는 깨어진 인간의 꿈을 웅변하면서 나뒹굴고 있었소. 벽돌도, 광석을 용광로까지 실어나르던 궤도차도 그대로 놓여 있었소. 흡사 다시 시동을 걸면 푹푹 소리를 내며 달릴 듯 한 자세로 말이오. 이곳을 그들의 말로 Borax라고 하던가요? 어쩌면 우리말의 "버력"과 비슷한지 놀라고 말았소. 그곳에서 한참을 서부개척시대의 노다지에 대하여 생각에 잠겨 있던 우리는 맞은편 Mustard Canyon에 반사되는 저녁놀을 바라보며 숙소로 돌아가게 되었소. Stovepipe Wells에 도착하기 직전 오른편을 바라보니 황량한 벌판이 펼쳐져 있고, 그 너머엔 고운 모래밭이 펼쳐져 있었고, 그 위로 몇 그루의 사막 관목들이 보이는 것이었소. 이름하여 Sand Dune. 그냥 갈 수 없다는 생각에 어둑발이 밀려드는 그곳을 찾았소. 아, 그 고운 모래밭. 내 유년시절의 꿈과 슬픔을 스펀지처럼 빨아들여주던 내 고향의 그 모래밭이 이곳에도 펼쳐져 있었던 것이오. 얼마나 반갑던지요. 그래서 우리는 마구 소리 지르며 뒹굴었소. 그런데, 경고문에 보니 이 모래밭의 관목들 사이로 밤이면 먹이사슬의 향연이 펼쳐진다는 것이었소. 말하자면 낮동안 뜨거운 햇볕을 피해있던 동물들이 이곳을 찾아 활동을 하고, 그들 사이에 생존경쟁의 엄연한 현실이 벌어진다는 뜻이겠지요. 그 가운데 뱀도 들어 있다는 말에 우린 내일 아침을 기약하며 서둘러 숙소로 돌아왔소.
다음날 새벽같이 우리는 일출이 장관이라는 Zabriskie Point를 찾았소. 일출시각이 닥쳐오면서 시시각각 변하는 형형색색의 산줄기들은 참으로 장관입디다. 열탕의 분지도 해 뜨기 전에는 쌀랑하기 그지 없더군요. 그러니 태양은 위대한 예술가요, 대자연의 연금술사라 할까요? 어느 사진작가들은 망원렌즈를 들여다보며 그 차갑고 딱딱한 바위에 배를 대고 엎드려 그 황홀한 순간을 기다리고 있기도 합디다. 거짓말처럼 햇살이 밭이랑처럼 갈래진 계곡의 한쪽면을 비추는 순간, 저 높은 봉우리에서는 이글거리던 어제의 그 태양이 솟아오르데요.
참으로 장엄한 순간이었어요. 아마도 억겁을 두고 매일 이런 일이 반복되었겠으나, 내겐 이 일이 그날 처음으로 일어나는 역사적인 사건으로 기억된 까닭은 무엇인지 모르겠군요.
해 뜬 이후 Zabriskie Point를 떠난 우리는 근처에 널려 있는 나즈막한 봉우리들의 사잇길을 숨바꼭질 하듯이 드라이브 하며 그들에 각인되어 있는 세월의 흔적들을 찾아 나섰소. 어느 곳에는 광석을 캐기 위해 파 놓은 동굴도 있었고, 군데군데에는 생명력 질긴 열대식물들이 흡사 갈증을 참지 못하는 듯 늘어져 있기도 하였소. 그리고 그 사이사이로는 이름 모를 여린 잡초들이 꽃을 피운 채 처량한 모습으로 숨죽이고들 있더군요.
아, 더위와 피로에 지친 우린 많은 코스를 생략해야 했지만 험준한 산맥으로 둘러싸인 물 없는 바다를 헤엄친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했었소. 우린 삶과 죽음이 어우러진 靜謐의 공간을 처음으로 '만져 보았던' 것이오. 아니 정녕 죽음은 종말이 아니라 언제고 다시 깨어날 수 있는 생명을 잉태한 가능태였소. 나는 데쓰밸리의 열기 속에서 언젠간 터져나올 생명의 코러스를 들을 수 있었단 말이오.
잘 계시오.
* 사진을 첨부하였습니다. 위의 내려받기에서 압축된 파일을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2002-08-08
첨부파일
- deathvalley.zip (3.4M) 12회 다운로드 | DATE : 2021-05-13 16:16:46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