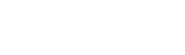시한부 인생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5-13 17:10 조회 300회 댓글 0건본문
며칠 전 어떤 지하철역 화장실 안. 일을 보면서 눈앞의 벽을 보았다. 하나의 문구가 붙어 있었으니 가로되,
“우리가 헛되이 보낼 수 있는 오늘은
어제 세상을 달리 한 누군가가
소중히 그리워한 내일입니다.”
아, 이 말이 그만 내 뒤통수를 세게 치는 거였다. 참으로 적절한 타이밍에 나를 일깨워 주는 말이었다. 대충 일을 마치고, 생각에 잠기기로 했다. 매일매일 나는 얼마나 빈둥거리며 살아 왔는가. 내 배낭에 가득 찬 시간들의 무게를 얼마나 못 견뎌했으며, 그것들을 아낌없이 길바닥에 내팽개쳐왔던가. 흡사 가볍게 길을 가고자 하는, ‘허허로운’ 나그네의 심정으로. 그러나 그간 쓸모없다고 버려온 그것들이 돌멩이가 아니라 ‘시간’임을 이제야 비로소 깨닫게 되었으니.
얼마 전 대학 시절의 친구 하나가 떠났다. 그는 이른바 ‘시한부 인생’을 살다 갔다. 암의 선고를 받고, ‘좀더 살아보려’ 무진 애를 쓰다가 끝내 가고 말았다. 아니, 어차피 가야할 길을 남보다 좀 앞 당겨 간 것이다. 물론 그보다 먼저 간, ‘억울한’ 인생들도 많을 것이다. 그러니, 먼저 간 그도, 좀더 남아있게 된 우리도 시한부 인생임은 마찬가지다. 그는 시인이었다. 삶의 무게를 영롱한 언어의 구슬로 빚어내는 연금술사였다. 악다구니로 모두를 피곤하게 하는 누구누구보다는 그가 더 오래 우리 곁에 남아 있어야 옳았다. 그러나 삶과 죽음이 인간세계의 ‘이치대로’ 되는 건 아니다. 아마 그를 우리보다 더 필요로 하는 곳이 있었을 것이다. 그는 그리로 불려 간 것이 틀림없다.
어젯밤엔 영안실을 다녀왔다. 그 분 역시 시한부의 삶을 사시다가 갓 60에 가셨다. 아직 장성하지 못한 아이들과 고운 때도 채 벗지 못한 아내를 두고 ‘쫓기듯’ 가셨다. 그곳엔 비슷한 죽음들이 즐비했다. 떠들썩한 영안실의 풍경이었다. 어쩌면 떠나는 길이 외롭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다. 그렇게 보면 ‘떠들어줄’ 아무도 없이 외딴 곳에서 혼자 죽어가는 죽음들, 전장의 고혼들이 겪을 적막함과 서러움이란 말해 무엇하랴.
가쁜 숨을 몰아쉬면서도 찬란한 태양이 떠오를 내일을 기대하는, 수많은 생명들이 있다. 내일이 비록 잿빛 가득한 시공일지라도 ‘산 자들’과 함께 하는 이승의 삶을 갈망하는, 여린 마음의 시한부 인생들이 있다. 그러나 시한부 인생으로 그들을 바라보는 우리 자신들이 정작 시한부 인생들임을 모르는 것은 더 큰 비극이다. 한 해가 마무리되어가는 지금,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이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 영안실의 복도를 살곰살곰 걸어볼 일이다. 그리고 산 자들 역시 시한부 인생을 살다가 죽은 자들과 마찬가지로 시한부 인생들임을 깨달아볼 일이다. 그리곤 무한히 겸허해질 일이다.
12. 9.
영안실을 다녀와서
백규
2004-12-1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