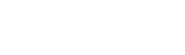新 西遊見聞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5-13 16:17 조회 120회 댓글 0건본문
新 西遊見聞
제 1 부 : 대학, 학문, 그리고 미국의 힘
제 2 부 : 자연, 사회, 그리고 미국인의 꿈
들어가는 말.
IMF체제에 막 들어선 1998년 1월 7일, 도망치듯 우리는 우리나라를 빠져나왔다. 마지막 피난선에 가까스로 올라 부두에서 울부짖는 인파를 내려다 보던, 그 당시 흥남부두의 그 사람도 그랬을까? 여하튼 죄스러움과 홀가분함을 제대로 분간치 못한채 우리는 김포발 LA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던 것이다. 막연한 불안감과 호기심, 막막함으로.
제주도(?)에 몇 번 가본 일과, 중국에 다녀온 것 외에 해외라곤 나가보지 못한 내가 내 입과 귀만 주시하는 내 가족들까지 이끌고 신대륙을 몸소 체험하기로 한 것이었다. 파고다 공원의 공짜 점심 행렬같은 '안식년의 차례'에 떠밀리다시피 떠나야할 입장이었으므로 더욱 여유가 없었다. 천만다행, LG 연암재단으로부터 나로서는 받아본 적이 없는 거액(?)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되었다. 그 지원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감히 IMF 치하의 조국을 떠날 엄두를 낼 수 있었을까?
공항에 도착하니 날씨가 기막히게 좋았다. 화사한 햇살이 공항으로부터 숙소에 이르는 넓은 길가의 넓적한 가로수 잎파리들에 반사되어 이국적인 풍경을 더해주고 있었다. 공항으로 마중나와준 생면부지의 배광복, 김광태, 안용흔선생과 그 가족들의 마음 씀씀이만큼이나 화창한 날씨였다. 그들의 도움으로, 카펫 깔린 다소 어색한 아파트에 둥지를 틀게 되었다. 발코니 밖 5m 전방에는 잎 넓은 팜 츄리 한 그루가 하늘 높이 솟아 있었고, 온통 나무로 뒤 덮인 언덕 위의 지붕에는 늘 까마귀와 이름 모를 온갖 새들이 날아와 지줄대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아파트 앞 쪽으로 뻗어있는 전선에는 항상 살진 청설모가 분주하게 오가는, 그런 공기 맑고 깨끗하며 조용한 동네였다.
내가 살던 동네는 LA downtown으로부터 10번 free way를 타고 서북쪽으로 30분쯤 달리면 도착되는 곳인데, Palms Boulavard와 Rose Avenue 사이에 위치한 UCLA의 대학 아파트였다. 대체로 UCLA와 Holly Wood, Santa Monica, Palms Boulavard를 잇는 삼각지대는 West LA로 불리며, 주민들이 누리는 삶의 질 또한 높은 곳이었다. 그곳에 둥지를 틀고, 나는 1년 동안 나름대로 공부와 여행을 할만큼 한 셈이다.
미국에서 돌아온지 이제 2년째로 접어든다. 미국에서의 1년을 한동안 팽개쳐두고 있었다. 그러다가 막상 마음 속 깊은 곳으로부터 그것을 건져 올리니 영 낯설기만 하다. 이제 조금씩 기억을 더듬어 적어 나가기로 한다. 조금씩 적는대로 내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하였다. 내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는 손님 여러분께서 많이 격려해주셨으면 한다. 미국에서 1년 살다 온 것이 무어 그리 대단할까만, 그러나 나는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특히 미국 대학의 모습은 분명 부러웠다. 뭣같은 우리나라의 대학들을 생각하면 꿈같은 곳이었다. 이 말은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는 "그럼 그곳에서 살지 무엇하러 다시 돌아왔니? 이 얼간아!"라고 하실지도 모른다. 사실 당시 나는 "내 나이가 10년만 젊다면, 그냥 몇 년 눌러앉아 푹 삭힌 뒤에 귀국할텐데"라고 못내 아쉬운 생각까지 하고 있었다. 당시 내 나이에서 10년을 뺀다면 33이었다. 지금의 내 나이로도 못할 일은 없겠으나, 걸리는 게 많고 정리해야할 인연들이 우리나라에 너무 많았다. 30초반이라면 도박의 패를 던질 수도 있었으리라고 생각되는 것이었다. 내가 미국에서 한 동안 공부하고 싶었던 것은 우리나라나 우리나라의 대학들을 싫어해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넘치는 애정을 갖고 있기 때문이었다. 학문도 학문이려니와 대학의 돌아가는 시스템을 보고 그냥 눈 감은 채 돌아올 수는 없었다. 물론 내가 가 있던 UCLA도 미국내에서 최상급의 대학이라고 할 수는 없을지 모른다. 그 대학사람들은 늘 동부 지역의 아이비리그를 비롯한 세계 정상의 대학들과 자신들을 수시로 비교하며 자신들을 채찍질하고 있었다. 서부지역의 스탠포드나 칼텍, UW, 같은 UC계열의 버클리 등과도 항목별 수치를 조목조목 비교해가며 자신들의 장단점들이나 우열을 솔직히 거론하는 모습은 놀라움 그 자체였다. 크레믈린처럼 늘 못난 모습을 숨기면서 무언가를 늘 꾸며내고 있는 듯한 우리나라 대학의 분위기에 젖어있던 나로서는 신선함 그 자체로 다가왔다. 지금의 우리나라 대학들은 학생들은 물론 나를 비롯한 비교적 젊은 교수들과 우리나라의 미래를 암담하게 만드는 공룡떼라고 할 수 있다. 얼마전 어떤 교수의 베스트셀러 "대학이 망해야 나라가 산다"를 나는 하룻밤에 독파하고는 공감과 감동으로 눈시울이 붉어짐을 금치 못했다. "아! 나만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동류(료?)의식을 나는 진하게 느낄 수 있었다. 나 역시 그런 책을 한 번 써볼까 하는 가당챦은 객기(?)를 전부터 가지고 있긴 했으나, 이미 그 책을 본 이상 더 무슨 이야기를 덧붙일 수 있을까? 통탄스럽도록 비극적인 것은 그 책이 나와 수십만부가 팔려나간 시점에도 우리나라들의 대학은 여전히 태평천하요 오불관언이라는 점이다. 왜 그럴까? 대학내에 우글거리는 인재들의 손발을 꽉 묶어놓는 '망령'이 과연 무엇일까? 우리는, 아니 우리나라 교육당국자들은 왜 언필칭 미국과 같은 선진국의 대학들을 배운다고 하면서 그들 대학이 하는 일들을 흉내조차 못 내는가? 왜 그 근처에도 못 가는가? 지금 우리나라의 대학들에 그 미국에서 일류교육들을 받고 박사학위까지 받고 돌아와 교수로 있는 제제다사들은 왜 모두 벙어리처럼 입을 닫고 있으며, 왜 오히려 한 술 더 떠 후진적 행태의 대열에 적극 동참하고 있는가? 미국에 있는 동안 그 점이 참으로 궁금했고, 그 궁금증은 지금도 그러하며 앞으로 상당기간동안 쉽게 해소될 것 같지 않다.
이제부터 내가 그곳에서 공부하고 생활하며 보고 느낀 것을 한 꼭지씩 연재할 예정이다. 단편적이긴 하겠지만, 밑바탕에 깔린 내 생각은 분명 일관성을 보여줄 수 있으리라 본다. 내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시는 모든 분들의 애정어린 비판을 고대한다.
2000. 2. 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