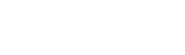학문적 담론의 시대를 지향하며 - 제1차 集談會를 마치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5-13 16:27 조회 162회 댓글 0건본문

학문적 담론의 시대를 지향하며
-제1차 集談會를 마치고-
대학가에, 그것도 인문학자들의 공동체에 대화가 없다는 것은 최대의 비극이다. 우리는 입만 열면 인문학의 쇠락과 고사(枯死)를 언급하지만, 정작 왜 그런가에 대하여 진지하게 탐구하려는 의지는 찾아볼 수 없다. 학자들 사이에 만연되어 있는 ‘고립주의∙이기주의∙나태∙무기력’ 이 그렇게 만들었다고 본다. 사실 인문학을 비롯한 모든 학문의 탐구∙전수∙발전에는 대화가 필수적이다.
학문에서만 대화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 대화는 삶의 근본적인 방식이다. 우리는 끊임없는 대화 속에서 산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우리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도 우리 조상들과의 끊임없는 대화 없이는 불가능하다. 지금보다 좀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 또한 우리보다 나은 삶을 살고 있는 나라나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일방적인 발화(發話)는 대화가 아니다. 나는 교수가 학생을 가르치는 강의실에서도 최우선적으로 대화가 성립되어야 한다고 본다. 교수의 말은 절대적 진리가 아니다. 다만 학생들로 하여금 참고로 삼도록 주어지는 하나의 견해일 뿐이다. 그 견해에 대하여 학생들은 자신들의 생각을 말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런 말들을 통하여 새로운 의미를 깨달을 수 있어야 한다. 교수는 열심히 말하고 학생들은 열심히 받아적는 것을 대학강의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런 대학 강의라면 비싼 등록금 지불하며 대학교육을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러나 그것이 대학교육 혹은 대학강의라고 생각하는 교수와 학생이 아주 많다는 현실을 부정할 수 없다.
책이나 논문을 읽는 것도 마찬가지다. 비판정신이나 대화정신으로 무장하지 않고 책을 대할 경우, 대개 그 논저자의 생각에 매몰되기 십상이다. 논저자의 주장에 매몰되어 무비판적인 추종자가 되는 경우, 거기서 우리는 대화를 발견할 수 없다. 비판을 통해서 논저자와 구별되는 생각을 안출해내는 일이야말로 대화의 생산적 결실이며, 모든 글의 본질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어렵긴 하지만, 자기 자신까지도 비판할 수 있는 일이야말로 생산적 비판의 진수라고 본다.
그런데 비판은 대화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대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열린 마음이다. 내게도 얼마든지 잘못이 있을 수 있다는 점, 그런 잘못을 지적해주는 일이야말로 나를 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비로소 남의 비판을 수용할만큼의 여유가 생긴다. 지금 이 사회의 식자층들에 의해 자주 거론되고 있는 공자(孔子)도 “허물이 있거든 고치는 것을 꺼리지 말라(過則勿憚改)”고 했다. 고치려 해도 허물이 무엇인지 알아야 할 것이 아닌가? 허물을 알기 위해서라도 그 허물을 지적해주는 사람의 말을 경청해야 할 것이다. 허물을 지적해주는 사람의 말을 고맙게 받아들여 자신의 행동이 수정된다면, 그 자체가 바람직한 대화의 결실인 것이다.
우리 사회에 대화가 없다는 것은 모든 교수들이나 학생들이 마찬가지로 공감하는 문제다. 그러면서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고칠 생각을 하지 않는다. 타성적인 분위기 때문이다. 말하는 자와 듣는 자 사이의 ‘일직선적인 오고 감’ 만으로는 진정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다. 모든 방향에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상태의 대화만이 진정한 대화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한국의 대학사회는 대화가 부재한 곳이요, 죽음의 원칙만이 힘을 발휘하는 곳이다. 아무리 대 석학을 모셔다가 고명하신 말씀을 듣는다 해도 일방적인 강의에만 그친다면 그걸 대화라 할 수는 없다. 총장이나 교수가 만능일 수 없으며, 오히려 지적인 순발력을 요하는 일들에서는 학생을 따라잡을 수 없는 경우도 많다. 물론 학생들 사이에도 대화보다는 일방적 성향과 독단적 성향이 자리잡고 있는 것을 자주 느낀다. 특히 특정 이념이나 경직된 학생활동을 통해서 엿보게 되는 그들의 내면은 기성세대 뺨칠 정도다. 그들 역시 대학사회의 부정적 성향에 물들고 있다는 증거일 것이다.
1990년대 이후 대학사회 내의 대화부재현상은 더욱 심화되어가고 있음을 느낀다. 민감한 현실적 이해(利害)에 관계되는 일에는 대부분 장시간 적극 나서서 열들을 올린다. 그러나 그럴 경우도 자기 주장 일색이므로, 그것을 대화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런 자리에서 심심찮게 육두문자들까지 등장하는 것을 보면 대학사회나 시장판이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통탄스럽게도, 그런 일에는 수업을 제껴가면서까지 잘들 모이면서 조금이라도 학술적 성격을 띤 모임들에는 그야말로 ‘인영(人影)이 불견(不見)’이다. 사정사정해야 마지 못해 얼굴만 슬쩍 들이밀어 눈도장만 찍고 돌아가는 것이 고작이다. 대학인들이 스스로의 위상을 깎아내리는 행태는 여러 구석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그들이 즐겨 참석하는 모임의 성격을 보면 우리나라 의 대학이나 학문적 수준을 짐작하기에 어렵지 않다. 이런 문제점들은 잘못 되어가고 있는 대학의 분위기나 대화의 분위기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자꾸 제기되고 이야기되어야 한다.
나 자신을 포함하여 현재 대학의 구성원들이 바람직한 문화 창조에 큰 기여를 못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시도해본 것이 ‘집담회(集談會)’란 행사였다. 보기에 따라 나를 포함한 몇몇 사람들의 출판기념회를 곁들인 것은 옥의 티로 생각될 수도 있었겠지만, ‘이야기 거리’를 고안하는 일이 쉽지 않다는 현실 때문에 그 점은 불가피했다.
내가 ‘집담회’ 이야기를 꺼내니 숭실대 영문과의 이인성교수는 대뜸 ‘콜로퀴엄colloquium'아니냐고 물었다. 사실 콜로퀴엄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면서도 명칭 때문에 골머리를 앓다가 궁색하나마 ’집담회‘란 조어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나로서도 내 본심을 엿보인 듯한 겸연쩍음을 감출 수 없었으나, 명칭의 의미야 어떻든 출발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모임에 참석해주신 소재영선생님께서는 일본의 대학가에도 ’집담회‘라는 모임이 자주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다. 그곳에서는 책을 출판하기 위해 원고가 완성되면 집담회를 통해서 그 타당성을 토론하고, 책이 만들어진 후에도 똑 같이 검토하여 처음의 모임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수정되었는지를 확인한다고 한다. 그런 연유로 그곳에서는 집담회를 통할 때마다 새롭게 수정된 내용들이 덧붙기 때문에 이 모임은 학자들의 사회에서 아주 중시된다고 했다. ’말 만들기 좋아하는 그들 역시 나와 생각이 같았구나.‘ 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본의 아니게 그들의 아이디어를 도용한 것으로 비치지는 않을까 약간 걱정스런 일면도 없지는 않았다. 그런 까닭에 처음부터 이 명칭에 대한 지적 소유권을 갖고 싶었던 내 얄팍한(?) 계산은 어긋나버린 셈이었다.
그렇다면 이 모임의 의미와 본질은 무엇인가. 우선 이 모임과 비슷한 서양의 모임으로 앞에 말한 콜로퀴엄이 있다. 메리엄 웹스터 사전(Merriam Webster's Collegiate Dictionary, 10th Edition)에는 이 용어가 “전문가들이 하나의 화제(話題) 혹은 관련 화제들에 대하여 발표하고 그에 관한 질문들에 대답하는 학술적 모임”으로 설명되어 있다. 반하트(Robert K. Barnhart)의 어원사전(The Barnhart Concise Dictionary of Etymology)에는 래틴어인 이 말이 ’함께 이야기하기(speak together)‘로부터 나온 학술회의, 대화 등을 의미한다고 설명되어 있다. 말하자면 공통된 화제를 두고 함께 생각하고 이야기한다는 것이 이 말의 본래적인 의미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의 첫 시도에서는 다른 나라들의 선례까지 참조할 여유가 없었다. 우선은 내가 속한 이 집단의 답답한 분위기를 깨고 싶었는데, 그런 일을 벌일만한 계기가 필요했다. 그런데 그야말로 우연히 내 책과 곽원석선생의 책이 같은 출판사(도서출판 월인)에서 거의 같은 시기에 출판되게 되었다. 여기에 6월에 책을 낸 장경남선생도 있었다. 떡 본 김에 제사지낸다고 우리는 3인 출판 자축회를 이 집담회의 언턱거리로 삼게된 것이었다.
예상했던 것처럼,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짓이냐는 반응들이 ‘무반응’의 형태로 전해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내준 몇몇 교수님들과 소수의 대학원생, 학부생들이 모여 그럭저럭 대화의 분위기는 이루어질 수 있었다. 끝난 뒤 약간의 허탈감을 갖긴 했지만, 그래도 이 집단에 무언가 출발의 신호 정도는 보낸 듯 하여 마냥 공허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사실, 처음 생각으로는 대화 분위기 자체가 중구난방이어도 좋다고 생각했다. 집담회의 ‘집(集)’ 앞에 ‘의(衣)’를 부수로 붙이면 ‘잡(襍=雜)’이 된다. 말하자면 집담회 아닌 잡담회(襍談會=雜談會)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격식없는 대화의 자리일 경우 잡담회면 어떻고 집담회면 어떤가? 학문적 내용을 중심으로 서로의 견해를 존중하는 가운데 구성원들이 동참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번과 같이 졸속의 상황에서 각기 다른 세 개의 주제가 아니라 구체적이고도 단일한 주제만 마련된다면, 멋진 집담회가 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어렴풋이나마 갖게 되었다. 잘만 되면 이 모임의 명맥은 이어질 수 있으리라 본다.
대학의 생명은 끊임없는 대화에 있다. 선학들과의 대화, 동료들과의 대화, 책이나 논문을 통한 논저자들과의 대화, 교수와 학생간의 대화, 사회인들과의 대화, 심지어 자기 자신과의 끊임없는 대화 등 온갖 대화 속에서 대학은 존속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화의 부재 속에서 진정한 대화의 개념마저 모호해져 버린 것이 한국 대학들의 현실이다. 말은 넘치되 진정한 대화는 말라버린 사막, 오아시스 없는 사막이 바로 한국의 대학들이다. 대화의 장, 담론의 장을 대학 안에 많이 만들어야 한다. 많이 가진 자가 조금 가진 자에게 나누어 주는 일방적인 연설의 장, 강연의 장이 아니라 서로가 주고 받고, 참견하고 참견받는 그런 다양한 대화의 장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관심을 정치에서 학문에로 시급히 옮겨야 한다. 상식 선에서만 일을 처리해 준다면, 학장이나 총장에 누가 앉든 그게 내 학문의 연마나 후학의 양성과 무슨 관계가 있으리오? 한 권의 책을 읽고 한 줄의 글을 쓰기에도 바쁜 지금 그런 일들은 모두 내 관심 바깥에 놓여있다. 우리 모두 황폐화된 담론의 장을 재건하는 데 나서야 할 때가 되었다.
* 사진을 첨부하였습니다. 위의 내려받기에서 압축된 파일을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2002-08-08
첨부파일
- zipdamhoe_fotos.zip (232.9K) 14회 다운로드 | DATE : 2021-05-13 16:27:3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