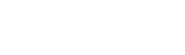연민 이가원선생님의 부음을 담양에서 접하고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5-13 16:28 조회 157회 댓글 0건본문
연민 이가원선생님의 부음을 담양에서 접하고
문하생 조규익
“未歸三尺土하얀 難保百年身이요 旣歸三尺土하얀 難保百年墳”이라더니
오호라, 드디어 백년도 못 누리시고 가시는군요.
큰 나무가 쓰러지는데 어찌 이리 하늘은 청초하며 계곡은 이리도 고요할까요?
어찌 이 몸은 이리도 박복하여 번번이 은사님들의 마지막 모습도 뵈옵지 못하는지요?
한 달 전 선생님을 병석으로 찾아 뵈었을 때, 고통의 신음 속에서 이으시던 몇 마디 말씀이 결국 이 보잘 것 없는 제자에게 남기신 유언이셨단 말입니까? 젊었을 때 건강에 좀더 신경을 쓸 것을 이제서야 후회가 생기노라는 말씀. 새봄이 오면 당신의 『조선문학사』가 중국교수들에 의해 번역이 완료되어 중국 현지에서 출판기념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 그 끝에 “자네, 내년봄엔 꼭 중국에 함께 가세!” 하시며, 힘겹게 말씀을 이어가시던 그 노안(老顔)을 차마 바로 뵐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이죠. 제가 꼭 모시고 가겠습니다!” 라고 힘주어 대답은 드리면서도 선생님을 둘러싸고 있던 사신(死神)들의 난무(亂舞)를 바라보는 제 마음은 처연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제게 당신이 평소에 운동을 해오셨다면 지금 당신의 건강이 이토록 나빠지지는 않았을거라고 안타까움을 내비치셨지만, 젊은 시절 선생님께서 운동과 도락(道樂)에 싸여 지내셨다면 그간 이룩하신 그 업적들을 저희들이 어떻게 친견(親見)할 수 있었겠습니까? 선생님께서는 그토록 엄정한 ‘자기관리’를 통해, 많은 것을 남기고 가셨습니다. 쌓아 올리면 등신대(等身大)가 될만한 저서들, 수많은 수적(手迹), 기라성같은 제자들.
대부분의 필부필부들이야 그 알량한 돈 몇 푼 움켜쥔 채 몸부림을 치다가 허망하게 생을 마감하고, 고작 못난 자손들의 싸움거리밖에 남겨놓지 않던가요? 선생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형의 보물들을 남겨주셨고, 당신이 돈 아까워하지 않고 모아놓으신 수백억원대의 문화재들마저 자손들이 아닌 믿을만한 대학에 남겨주시어 모든 사람들의 공유물로 만드셨습니다.
심지어 십이삼년 전 선생님께서는 당신의 묫자리와 비문까지 손수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그저 선생님을 뫼시고 그곳에 가는 일만에 살아있는 우리에게 지워주신 유일한 부담이군요! 이 좋은 가을날 청량한 바람을 쏘이며 휘파람을 불며 선생님을 뫼시고 오래 전에 마련해두신 별장에 가듯이 말입니다. 그렇게도 못난 후학들이 걱정되셨습니까? 선생님의 마지막 가시는 그 길, 배웅마저 제대로 못하리라는 점을 어찌 그리도 꿰뚫어보고 계셨는지요? 가여운 후생들의 짐을 한 낱이라도 덜어주고자 하신, 그 마음쓰심이 지금 절절이 가슴을 파고 드옵니다만. 어찌 이리도 부끄러워지는지 알 수가 없군요, 선생님!
마지막 순간에 완성하신 『조선문학사』는 후학들에게는 엄청난 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늘 선생님께서는 “후생가외(後生可畏)”를 되뇌이셨지만, 그 말씀이야말로 이 노작과 함께 저희 후학들을 다그치는 매서운 회초리가 아니던가요? 대학자의 거처가 어찌 그리도 비좁고 어둡던지요? 그 장대하신 육신을 돌아 누이기에도 빠듯한 그 속에서 그 많은 업적과 경륜을 일구셨으니, 그보다 몇 배나 밝고 넓은 공간에서 삶을 즐기는 저희들은 어찌해야 하오리까?
선생님께서 한 평생 지고오시며 저희들에게 보여주신 인고(忍苦)와 근면의 짐을 이 못난 후학들이 어떻게 감당해야 하오리까? 아, 제대로 내세울만한 은사나 스승을 모시지 못한 이 몸이 그나마 입지(立志)와 불혹(不惑)의 언저리에 이르러 천운으로 만나뵐 수 있었던 선생님. 제자들의 당당한 반열에 들지도 못하는, 불초한 이 몸은 선생님의 수 많은 제자들 뒤에서 멈칫거리며 선생님의 체취를 몰래몰래 숨쉬어 왔습니다. 선생님의 제자들이 마시고 남은 온기를 호흡하며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고, 그 힘으로 저의 내면을 이나마 키울 수 있었습니다. 학자가 가야할 길이 무엇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제게 내려주신 ‘백규서옥(白圭書屋)’의 당호는 아직도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공자의 제자 남용이처럼 저도 ‘삼복백규(三復白圭)’하며 수양을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그래봤자 선생님의 발치에도 이르지 못하겠지만, 그런대로 멋스럽게 인생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절은 뭣같이 변해버렸으나, 선생님께서 사자후로 깨우쳐 주시던 그 ‘올바른 길’이야 언제까지나 ‘대도(大道)’로 우리 앞에 남아있지 않겠는지요? 그 길을 가고자 합니다. 결코 눈 앞의 큰 밥그릇만을 탐하지는 않겠습니다. 한 덩어리 육체, 때묻은 돈다발, 오욕에 찌든 명예에 이 짧고 귀한 생을 걸 수는 없겠지요? 그래서 선생님께서 걸어가신 그 발자국을 그대로 쫓고자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추위도 더위도 고통도 없는 그 곳에서 이제부턴 유유자적 한 길로 새 삶을 살으소서.
비록 먼 길 가시는 선생님께 노잣돈 한 푼 보태드리지 못한, 이 못난 제자가 당신의 뒤를 따르다 휘청거릴 때마다 붙들어 주시고 다독거려 주소서.
먼 훗날 그곳에서 선생님을 뵈올 때 만족하실 수 있도록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리오니, 제게 힘을 주소서.
2000. 11. 10.
담양 가사문학관의 한 구석에서
제자 규익 두 번 절하고 씀
2002-08-0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