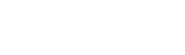신춘 대학 2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5-13 16:34 조회 142회 댓글 0건본문
신춘 대학 2제
1. 도서관이 급하다
대학의 심장부는 도서관이다. 선진국의 대학들을 가보라. 우선 도서관의 규모와 서비스의 질에 압도당하게 된다. 쾌적한 시설에 고금의 자료를 대부분 갖추고 있을 뿐 아니라 잘 훈련된 전문가들이 직원으로 들어앉아 고급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 곳.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 유수 도서관들의 자료를 내것처럼 이용할 수 있는 상호대차 서비스. 그 뿐이랴! 24시간 학생과 교수들이 모여들어 각종 자료들을 열람하거나 독서에 몰입하는 광경이야말로 세계를 이끄는 그들의 힘이 바로 대학, 그것도 도서관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웅변으로 보여준다. 그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참담할 지경이다. 도서관에 대한 우리의 무지와 무관심을 우리나라 교육이 망해가고 있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아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도서관이란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인 '부대 시설'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그러니 정책 당국자나 대학 운영자들은 도서관을 시험공부나 하는 독서실 이상으로 생각하지 못한다. 교수들도 더 이상 도서관에 기대할 게 없다. 학생들도 소설 나부랑이나 읽고 가끔 리포트나 작성하며 시험공부나 하는 장소 이상으로 생각지 않는다. 이런 상태에서 아무리 공부와 연구를 강조한들 결과가 제대로 나올 리 없다. 대학의 학문 인프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도서관임에도 불구하고 도서관에 대한 투자가 없는 현실. 우리나라 대학들의 원초적인 비극은 여기에 있다.
건물이나 시설 등으로 우리보다 앞서 가는 다른 대학들에 비해 우리 대학은 말할 수 없이 초라하다. 다른 대학들은 자료를 확충한다거나 도서 활용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소프트웨어적 측면에 왕성한 투자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 그렇게 하기는 커녕 그런 소프트웨어를 수용할만한 하드웨어 자체가 너무도 부실하다. 더 이상 신간도서를 들여오기가 겁날 정도로 좁고 위험한 건물을 그냥 둔 채 어떻게 도서관의 내실을 기한단 말인가. 이미 대학내 건물의 신축에 관한 계획이 서 있겠지만, 도서관 건물만은 모든 것에 앞서 지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왕 지을거라면 적어도 수십년은 마음놓고 소프트웨어의 확충에만 신경 써도 될만큼 튼튼하고 넓은, 기념비적인 건축물이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남들보다 뒤져 있다면, 그 원인의 상당 부분이 도서관의 부실에 있다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이제 도서관 만큼은 아무리 호화롭게 지어도 결코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 사설, 숭실대신문 799호, 2001. 3. 26
2. 박물관 자료의 이용에 대하여
나는 고전문학 전공자다. 연구를 하다보면 수시로 옛 자료들을 보아야 한다. 주로 국립도서관이나 장서각, 규장각 등을 통해 필요한 자료들을 입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큰 금액을 주고 직접 고서상들로부터 사기도 한다. 이렇게 해도 입수할 수 없는 것으로 우리 대학 박물관에 소장된 자료일 경우 그곳에 의뢰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자료를 이용하기가 만만치 않다. 사정사정하여 입수한다해도 기분이 썩 좋지는 않다. 직원의 눈치를 보다보면 내가 흡사 우범자라도 되는 느낌이다. 그런데, 시대의 흐름에 마냥 뒤질 수는 없었다고 판단해서였는가, 몇 년 전부터 박물관은 일부 자료를 복사하여 도서관에 넘긴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그걸 이용하려해도 장애는 여전하다. 우선 복사물들을 철통같은 자물쇠로 겹겹이 잠궈놓고 흡사 가보 다루듯 하는 것이 눈에 거슬린다. 그걸 보려해도 세밀한 열람신청서를 작성해야 하고, 부분 복사만 가능하다. 오늘 반쯤 복사하고 내일 절차를 다시 밟아 나머지를 복사해도 되는 거라면, 아예 한 번에 전권을 복사해주면 좀 좋겠는가? 오히려 박물관이나 도서관이 나서서 "우리는 이러이러한 자료들을 소장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연구해 보시오!"라고 권장할 수는 없는가? 우리 대학의 박물관은 가능하면 교수들이 자료를 이용하지 말았으면 하고 바라는 듯한 인상을 준다. 교수가 자료를 보려는 것이 연구 이외에 무슨 목적이 있단 말인가? 더구나 나는 다른 대학이 아니라 바로 이 대학의 교수다!
박물관이나 도서관의 담당자들에게 고개 넘어 서울대의 규장각에 한 번 가볼 것을 권한다. 그곳에도 우리 대학 못지 않게 귀중한 자료들이 많다. 웃음으로 맞아주는 직원에게 간단한 열람서 한 장만 내밀면 더 이상 말이 필요없다. 마이크로필름으로 된 자료의 경우 친절하게 사용법까지 알려준다. "오늘 반만 복사하고 내일 다시 와서 나머지를 하라"는 식의 말도 안되는 말을 하는 법이 없다. 전권을 하든 한 페이지를 하든 그건 열람자의 필요에 따를 뿐이다. 나는 이런 곳의 자료를 이용하면서 비로소 내가 일개 교수요, 학자가 된 느낌을 갖게 된다. 왜 우리는 이렇게 못하는가? 박물관이나 도서관은 교수와 학생들에게 봉사하는 기관이다. 아무리 귀중한 책이라 해도 유리장 안에만 묵혀 두면 썩어 없어질 뿐이다. 물론 원본은 보관해야겠지만, 복사본이라도 도서관에 비치하여 열람자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용자들에게 "숭실대 기독교박물관 소장본"이라는 점을 논저에 명시해야 한다는 조건만 달면 된다. 그리고, 박물관이나 도서관은 그런 연구물들을 잘 받아서 챙기기만 하면 된다. 그 이상 무슨 보람을 기대하는가?
- 교수여론, 숭실대 신문 799호, 2001. 3. 26.
2002-09-0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