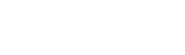애정·집착, 그리고 시퍼렇게 날선 달관-동포선생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5-13 16:43 조회 159회 댓글 0건본문
애정·집착, 그리고 시퍼렇게 날선 달관
- 동포선생께
* 행복의 원칙은 첫째 어떤 일을 할 것,
둘째 어떤 사람을 사랑할 것,
세째 어떤 일에 희망을 가질 것 등이다.
-칸트-
동포선생님!
1
혹시 ‘미개구착(未開口錯)’이란 말을 들어 보셨는지요? 어떤 대상의 본질을 짚어 내고자 하나 “입을 열기도 전에 벌써 그르쳤다”는 뜻으로 이해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저같이 세상 명리(名利)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는 속한(俗漢)의 입장에서야 어찌 그 깊은 이치를 알 수 있겠습니까만, 제가 하고 있는 일들이란 게 모두 이런 류가 아닌가 하여 겁도 나고 회의가 들기도 하는 요즈음입니다. 말과 글로 제 마음을 표현하는 일, 말과 글로 저의 그 알량한 지식 나부랑이를 어린 영혼들에게 가르쳐 주는 일 등이 얼마나 등짝에 진땀나게 하는 일인지 새삼 깨닫게 되는 요즈음입니다. 옛날 도사들이 묵언(?言)과 면벽(面壁)으로 수십년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래서 절실히 깨달아지는 요즈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한 말을 아끼기로 했지요. 살얼음 밟듯 살곰살곰 찾아 간 동포선생댁. 지금 그 사립문 밖에 쭈그려 앉은 채 뜰안을 훔쳐보며 귓속말로 소근거리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구요. 그러나 말을 아낄 땐 아끼더라도 이왕 여기까지 왔으니 그냥 갈 수야 없지요? 그래서 몇 말씀 남기고 내뺄까 합니다.
2
저는 으레 남들에게 ‘백화산 자락에서 태어나 열정적으로 태안을 지키며 사는 사나이’로 선생을 소개하곤 합니다. 백화산은 참으로 묘한 산입니다. 사실 높이나 깊이, 숲이나 골짜기 등으로 말한다면 백화산이야 어디 산축에 들기나 하나요? 그런데도 올라가 보면 아스라히 보이는 가로림만과 천수만을 비롯한 연안과 넓디넓은 들판이 끝 간 데 없이 발 아래 펼쳐져 있더군요. 그만큼 드러내지 않고도 우뚝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시들이 높은 산들을 등지고 있지요? 제법 높아 보여도 올라가 보면 실망하는 적이 많아요. 주변에 늘어선 군봉(群峰)들 때문에 주눅들어 있는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이지요. 그에 비하면 백화산이야 얼마나 대견합니까? 요란스레 자랑하지 않으면서 자랑스런 모습을 지닌, 저 아담한 돌산이 말이오. 겉으론 느릿한 토장맛 사투리에 숨죽이면서도 속은 얼마나 옹골차고 아름답던지요? 제법한 나무 한 그루 키워내지 못하는 돌 투성이의 백화산. 그러나 그 산의 내적인 아름다움을 아는 사람만이 태안을 사랑할 수 있으리라 보는 것은 건방진 저만의 너스레인지요? 어쨌든 백화산에 빠져있는 동포선생의 모습은 백화산 그 자체이지요. 백화산을 사랑하다가 백화산의 모습에 동화되어 온 거라고나 할까요?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며 자라나 결국 ‘큰 바위 얼굴’과 똑 같아진 어니스트처럼 말이지요. 느직한 태안 사투리로 가끔은 무엇을 향해 욕설을 뱉어내기도 합디다만, 한 꺼풀만 벗겨보면 인간적이고 따스한 통찰력으로 가득차 있는 선생의 내면이 곧바로 드러나는 건 어쩔 수 없지요. 뭐니뭐니해도 참으로 놀라운 것은 태안에 대한 선생의 지극한 사랑이오. 마찬가지 태안사람으로 태어난 저는 애국가를 부를 때마다 “대한사람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의 ‘대한’이 ‘태안’인 줄로만 알고 초등학교를 마친 얼간이이긴 하지만, 지금껏 궁핍의 이미지로 개칠되어 있는 내 유년시절의 고향에 애착을 갖기가 그리 쉽지는 않군요. 선생에게나 제게나 태안은 고향이지요. 그러나 선생에게는 고향에 대한 사랑이 있지만, 제게는 그게 없어요. 고향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지역사회를 사랑할 수 있고, 지역사회를 사랑하는 사람만이 나라와 세계와 자연을 사랑할 수 있답디다.
3
선생이 태안정신을 왜 그렇게 부르짖고, 신두리 백사장을 왜 그리도 아파하는가를 이제사 알게 되었어요. 선생의 고향이나 자연이 하루 이틀 때려먹고 치워버릴 것들인가요? 선생은 입만 열면 언제나 자손만대를 언급하시더군요. 맞아요. 굴삭기로 자연을 파헤치는 자들은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제끼고 운명을 담보로 한탕하겠다는 심뽀들로 가득 차 있지요. 신의 섭리를 거역하여 우리의 자손들로 하여금 나락으로 떨어지도록 하고 있는 거죠. 참으로 어리석은 군상들입니다. 선생의 절규를 한 마디만 들어 볼까요?
신을 벗고 맨발로 사구를 걸었다. 다행스럽게 사구는 보존하게 되었지만 그 댓가는 허리를 들어내고 무참히 파헤쳐진 몰골, 중장비로 톱으로 밑동이 처참하게 잘린 저 푸르렀던 소나무, 인간의 나약함인가 욕망의 몸부림이었던가 땀방울처럼 흘러내리던 소나무의 수액은 아직 아물지 못하고 피처럼 흐르다가 못 박힌 손처럼 굳어지고 있다. 그래도 갯바람 속에, 솔바람 속에 실린 비밀스런 소리는 봄이 오는 길목 따스한 햇볕 속에 스며 은밀한 솔향기로 영혼을 사르듯 우리에게 다가온다.
그들은 이번 해안사구를 지키면서 얼마나 가슴을 졸이고 눈물을 흘렸던가. 우린 이제 응어리진 그들의 가슴팍을 보듬어주어야 한다. 그들의 삶 일부분이라도 헤아려야 한다. 그들의 메마른 가슴을 조금이라도 치유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건 우리들의 뜨거운 마음 뿐이다. 들린다. 솔바람 소리가 들린다. 그러나 솔바람은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니다. 언제나 향기로운 것이 아니다. 다스리고 가꿀 때 향기가 나는 것이다.
<그 바람은 아직 쉴 곳이 없다>에서
서정과 서사가 뜨겁게 소용돌이치는 이 글 속에는 출근하다시피 매일 달려가 상처입고 신음하는 신두리 사구의 나날을 기록한, 선생의 애정과 집착이 엉겨 있어요. 고향에 대한 애정과 집착이면서, 후손들에게도 온전한 자연을 넘겨 주겠노라는 ‘깨달은 자’의 절규인 셈이지요. 그러나 결국 강하고 쇳된 선생의 목소리는 온유하고 평화로운 초원에 도달하게 되지요.
4
두어 마디만 더 들어볼까요?
신두리 바다는 이제 썰물입니다. 그것은 그대가 떠날 때의 모습입니다. 파도가 밀려가고 난 갯벌에 남은 무수히 많은 생명체처럼, 그대가 떠나고 난 내 마음의 갯벌에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상념의 생명체들이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나는 내 가슴 속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고 싶은 걸까요? 왜 텅 비어버렸다고 느끼고 싶은 걸까요? 떠나버린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저 작은 풍경 하나에서도 아주 먼 마음의 풍경을 보나 봅니다.
-<초라하고 부끄러운>에서
저는 풀잎이고 싶습니다. 바람보다 먼저 눕지만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는 풀잎을 생각하면 그래도 힘이 납니다. 지금 저는 섬세하면서도 열정적인 손길과 내부에 잠자고 있었던 욕망, 혹은 사랑의 뇌관이 터진 그런 것은 아니지만 또 다른 하나는 전혀 아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직까진 인생살이를 가볍게 살지도 않았고 무의미하게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상처 입으며 깨어있는 이유>에서
제가 보기에 썰물은 겸손이지요. 깨달은 자는 마음을 비운답디다. 우린 말없이 떠나는 자의 텅빈 마음을, 욕심을 버린 영혼을 이 글에서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선생은 그 텅빈 공간에 꿈틀대는 상념의 생명체들을 키울 작정을 하고 있어요. 그건 뭐겠어요? 텅 비어버린 공간에 깨끗한 미래의 씨앗을 뿌리겠다는, 서슬 퍼런 선언이 아닐지요? 달관, 그래요. 세상을 향해 빙그레 웃어줄 수 있는 여유는 달관한 자들만이 지닐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되지요. 미래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라도 달관을 넘어서는 의지를 보여야겠죠. 물론 바락바락 악쓰는 의지가 아니라, 빙그레 웃으며 씨앗을 뿌리다가 교회의 저녁 종소리에 감사기도를 올리는 농사꾼 부부의 달관, 바로 그것이지요. 그래서 선생은 ‘풀잎’이고 싶다는 겁니다. 풀잎은 민중이지요. 세상을 제멋대로 휘어잡는 권력자가 선생의 이상은 아닙니다. 참된 민중으로 다시 태어나려는 의지가 앞 부분의 달관적 태도와 썩 잘 어울린다고 보지 않는지요? 결국 인생을 가볍게 살지도 않고 무의미하게 살고 싶지도 않다는, 동포선생의 인간선언은 시퍼렇게 날선 달관의 경지에서나 우러나올 수 있지요.
지금 백화산을 사랑하고 신두리 백사장을 안타까워하는 선생의 마음이 이 책을 통해 환히 피어나고 있어요. 활짝 웃음짓는 백화산의 돌덩어리들처럼 말이오.
2002-09-09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