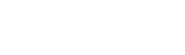하늘나라로 가신 함안영 선생님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5-13 16:48 조회 139회 댓글 0건본문
하늘나라로 가신 함안영 선생님께
선생님!
오늘따라 세차게 바람 불고 궂은 비가 내리는군요.
라마순이라는 생소한 이름의 비바람떼가 저 남태평양으로부터 몰려와 한반도의 중심을 괴롭힐 거랍니다. 날씨마저도 선생님의 떠나심을 슬퍼하는 건가요? 차창을 때리는 비바람소릴 반주 삼아 좁다란 경인고속도로를 처량하게 달려 왔습니다. 조용필의 <꽃이 되고 싶어라>를 제 가슴 속으로부터 쥐어 짜내듯 부르며 선생님의 마지막 모습을 뵙고 싶어 왔습니다. 아, 언젯적 모습인가요? 사진 속 선생님은 눈빛 형형한 40대의 청청함으로 저를 반기시는군요. 저보다 더 젊은 모습의 선생님을 뵈오며 저는 일순 몸둘 바를 모르겠네요. 금방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하실 듯 싶은 선생님의 표정을 차마 정면으로 응시하지 못하는 이 약한 마음이 내내 원망스럽습니다.
선생님!
저는 평소 제가 존경해온 선생님들의 마지막을, 선생님들께서 의식을 가지고 계시는 마지막 순간을 곁에서 모시는 것이 제 소원이었습니다만. 이번에도 결국 그 소원을 이루지 못하고 말았군요. 두어달 전 명동의 온지서당에 글 읽으러 나오시면서 제게 연락을 주셨죠? 신문에 게재된 보잘 것 없는 제 글을 보시고, 옛 제자의 모습을 기억 속으로부터 끄집어 내셨겠죠. 그리곤 예의 그 허스키한 음성으로 다정한 전화를 주셨고, 혹 결례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러워 하시면서 저의 신분을 확인하신 게 불과 몇 달 전 아니었나요? 그런데 어찌 그리도 바삐 이승과 저희들을 버리셨나요?
선생님!
저는 지금 웃음 띤 선생님의 영정 앞에 향을 피워 올리면서 선생님과의 첫 해후를 떠올립니다. 고2 시절 영어시간에 선생님을 뵙고 저희는 큰 충격을 받았지요. 선생님께서 월남의 전장으로부터 막 돌아오셨을 때였죠. 귀신 잡는 해병, 베트콩 잡는 해병, 청룡부대 중대장... 수색대를 이끌고 밀림 속을 헤쳐 나가던 중대장의 그 늠름한 모습, 아니 삶과 죽음의 경계를 매 순간 넘나드는 긴장의 눈빛에 우린 한 동안 숨 막혀하며 버둥댔지요. 우린 선생님으로부터 영어를 배운 것이 아니라 ‘삶과 죽음’에 내포된 모순과 화해를 배웠습니다. 선생님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죽음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죽음을 생각하고 나서야 오히려 삶의 소중함 또한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담담한 어조로 당신의 체험을 말씀하셨지만, 제겐 지금껏 “꺼내지 못한 병 속의 새”요, 해답을 찾아내지 못한 일생의 화두(話頭)로 남아 있습니다. “삶이란 무엇이고, 죽음이란 무엇이냐?” 방사선 치료도 거부하신 채 바삐 삶의 탈을 벗어버리신 것도 선생님께서 강조하신 ‘삶의 철학’ 때문이셨나요? 아무리 삶과 죽음에 초탈하셨다 해도 이 모자라는 제자에게 육성으로 한 마디쯤은 남기고 떠나셨어야 하는 건 아닌지요? 오래 전 선생님께서 던져주신 그 문제를 이 못난 제자가 얼마쯤이나 해결했는지 확인하신 다음 채점까지는 해 주셨어야죠? 바야흐로 제가 얻어가고 있는 결론의 타당성을 누구에게 검사받아야 합니까? 그럴 만한 인생의 스승이나 선배가 제 주변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선생님께선 이미 벗어나신 그 굴레를, 새삼 오늘 저는 또 하나의 과제로 떠안게 되었습니다. 사소한 이해관계에 그악스러운 군상들 속에서 등대를 잃어버린 저는 어떻게 저 안전한 항구로 무사히 들어갈 수 있을까요? 탐욕의 악마구리들 속에 저를 내던져 놓으시고 나몰라라 떠나신 선생님, 저는 어찌 해야 합니까?
선생님!
선생님은 그 당시에도 빼어난 멋쟁이셨죠. 이 경우 멋쟁이란 옷차림을 그럴 듯하게 하고 다니거나 용모가 말쑥한 사람을 뜻하는 말은 아닙니다. 사실 선생님은 용모로 따져도 그리 출중하지 못하셨고, 옷차림이래야 늘 당시 교사들에게 강요(?)되던 품위의 하한선을 겨우 유지할 정도로 후줄근한 양복 한 두벌이 고작이셨죠. 그럼에도 왜 우리는 선생님으로부터 ‘멋’을 읽어냈을까요? 1차적으로는 작은 이해관계에 그악스럽지 않으셔서 가난을 달고 다니시면서도 제자들과 어울려 즐기실 줄 아는 풍류 때문이었고, 2차적으로는 체질화된 삶의 철학 때문이었다고 봅니다. 이런 선생님의 장점이야 그 때나 지금이나 누구라서 감히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선생님들에게 고도의 근엄함을 서슬 퍼렇게 강요하던 그 시대에 명정(酩酊)의 객기를 부리실 줄 알던 선생님은 단순한 시대의 반항아만은 아니셨습니다. 당신의 의지와 갈등을 빚으며 자꾸만 엇나가던 사회 분위기를 말 없이 비판하던 한 철학자의 몸부림이었죠. 그런 모습 하나하나가 감수성이 예민하던 저희들 마음의 촉수를 건드렸던 겁니다. 선생님의 빈소에 다소곳이 서게 된 오늘에서야 비로소 선생님의 고뇌와 절망을 깨닫게 되었으니, 이 못난 제자의 미련함을 어찌 해야 한단 말입니까? “미련함에는 약도 없다”는 속담처럼 이 미련함을 옷처럼 입고 살다가 미련하게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선생님!
오늘 따라 왜 이렇게 비바람은 세차게 불어대는지요? 못난 제자에 대한 선생님의 질책으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왜 진작 한 번쯤 부르지 않으셨어요? “야, 이놈아! 내가 며칠 있으면 세상을 뜨는데, 네게 해줄 말이 있으니 내려 오너라!”고 말이죠. 억장이 무너지는 듯, 원통하고 원통합니다. 선생님의 그 허스키한 음성과 너털웃음을, 그것들에 담겨 있는 인간미를 어디에서 그 누구에게서 찾을 수 있을까요? 전 누굴 바라보며 제 삶의 옷깃을 바로 잡아야 하나요?
선생님을 보내드리는 오늘, 천 길 낭떠러지 위에 선 듯 제 자신을 가누지 못하며 통곡 통곡합니다.
편안히 잠드소서.
2002. 7. 6.
못난 제자 규익 통곡하며 두 번 절 올림
2009-09-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