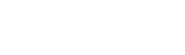윗세오름의 까마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5-13 16:08 조회 118회 댓글 0건본문
윗세오름의 까마귀
까마귀를 본 적이 있는가? 파아란 하늘에 하나의 점으로 날아오다가 휘익 소리를 내며 우듬지에 떨어지듯 내려앉는 그 까마귀를.
분명 시야를 어지럽히며 까마귀는 날고 있었다. 1700고지 윗세오름, 그곳에도 까마귀는 날고 있었다. 고독을 天刑처럼 이고 사는 까마귀의 저주스런 음성이 낮게 깔리는 그곳이었다. 고독을 견디지 못한 주목들도 어느 새 옷을 벗었는가. 하얗게 발가벗은 주검의 속살이 처량하기만 하다. 이곳에는 나무도, 새도, 꽃도, 버러지도 모두 고독에 찌든 듯 모두들 멍하게 조용하다. 예닐곱번 제주에 왔고, 이곳 윗세오름에만 세 번째. 그러나 초행인 듯한 느낌은 아마도 저 맑은 태양과 피어오르는 구름 때문이리라. 눈부시다. 파아란 하늘에 새하얀 구름. 그리고 그 사이로 점점이 찍혀오르는 까마귀들이라니.
배불리 먹고 길게 누워뻗은 우리의 얼굴과 귓가로 햇살은 사정없이 내려 박혔다. 1700고지의 따사로운 햇살과 시원한 바람은 내가 늘상 원하고 그리워하던 가을 들녘의 그것들이었다. 한동안 氣를 보충한 우리가 서귀포 방향의 영실 주차장을 향하면서 만난 노루가족들은 한가롭게 풀을 뜯고 있었다. 길 옆에는 '노루샘'이 맑은 물을 콸콸 쏟아내고 있었다. 벌판을 지나자 잘 꾸며진 서양집 정원 같은 숲 사이로 좁좁한 돌길이 끝간 데 없이 꼬불꼬불 비틀어져 이어지고 있었다. 우린 용암이 휩쓸고 지나간 계곡과 그 언저리의 돌벼랑들을 바라보며 태고의 굉음을 떠올리기도 했다. 모진 바람을 견디다 못해 삶을 하얗게 포기해버린 주목들을 쓰다듬기도 하고, 바야흐로 시들어가는 철쭉이며 이름모를 야생화들에 동정을 보내기도 했다. 저만큼 아랫녘으로는 몽글몽글 솟아나 있는 오름들이 수줍은 처녀애들마냥 우리를 훔쳐보고 있었다. 산중턱에는 괴수를 닮은 바위들이 우뚝우뚝 서 있기도 했다. 나는 그 가운데 하나를 지목하여 '티라노 바위'라 명명했다. 흡사 쥬라기 공원에 나오는 거대한 공룡, 티라노소러스를 빼다박은 바위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주위로는 두 다리를 엉버티고 서서 가족을 불러 모으는 불곰의 무리들이 널려 있었다. 장관이었다. 제주도에 예닐곱번을 오면서도 이런 코스를 한 번도 밟아보지 못했다니.
영실코스의 원시림을 내려오며 바라보는 서귀포와 바다는 한 바닥 낙원이었다. 진녹색의 바다에 듬성듬성 보이는 깔끔한 집들. 더껭이진 내 마음의 때를 두드려 빼듯, 서귀포의 푸르름은 나를 사정없이 들뜨게 했다. 호텔 마당에서 상체를 비스듬히 굽힌 채 물을 쏟고 있는 비바리의 물허벅을 통하여 저 푸른 바다의 물은 빨려 오고 있는가. KAL호텔로부터 20여분 거리의 횟집(어진이집)에서 만난 바다는 또 한 번 나의 얼을 빼놓았다. 비릿하면서도 달콤한 자리돔을 씹으며, 우리는 물고기 튀어오르는 바다의 짙은 푸르름에 넋을 놓을 수밖에 없었다. 횟집 건너편 산 기슭에는 일세를 울리고 웃기던 코미디언의 별장도 있긴 하더라만, 그거야 이 깨끗한 즐거움에 무슨 흠을 낼 수 있으리오? 통돼지의 고소한 살점을 씹으며 어두워가는 남국의 정취를 오롯이 만끽하는 우리에게 그 무슨 세속의 괴로움인들 밀려들 수 있으리오? 그러나 나는 이 저녁 이 바닷가에서 최하림의 <바다의 이마쥬>를 되씹고 만다.
밤은 갈증을 일으키며
검은 뜰을 지나 성급한 흐름으로 퍼져나가고,
초쾌한 빛깔이다 초쾌한 빛깔이다 바다여.
밤마다 우리들은 바라보고
기슭에 닿아우는 露臺에서
허망한 가슴으로 바라보지만
자꾸 별빛만 허리를 찍는다
아아 여백이다 적막이다 흘러가거라 흘러가거라.
풍선을 띄우며 아이들은 뜻없이 함성치고 바다를 부르지만
세계의 가슴에는 불합리의 그림자
水門의 둔한 물포래 우에 검은 장막이 날리고
상처입은 가슴들의 침묵 속에서
허리죽여 흐느낀다.
바람 셈 강가의 원망들이 휘몰아간다.
아아 꿈의 멀디먼 기슭에 서 있는 너, 너여
어떻게 달의 심장에서 回復할 것인가
너무나 커다란 비극의 기침 이제는 새로이 너를
생각하며 바라본다
----차라리 무망을 기르라 쉬임없이 흘러가거라 흘러가거라
희망과 절망의 기슭, 저편 언덕에
원색의 짙은 여백이 있을까
無望의 果實들이 바람도 없이 허공에 지고 있을까
흘러가거라, 흘러가거라, 초쾌한 빛깔이다 分身이다
최하림의 시심과 함께 제주의 밤은 그렇게 흐르고 있었다.
* 사진을 첨부하였습니다. 위의 내려받기에서 압축된 파일을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2002-06-27
첨부파일
- 2000_jeju_image.zip (1.3M) 12회 다운로드 | DATE : 2021-05-13 16:08:0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