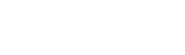촌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5-13 17:01 조회 147회 댓글 0건본문
촌놈
엊그제, 학회의 뒷풀이에서 있었던 일이다.
한 잔 또 한 잔 거래하는 사이에 주흥은 도도(陶陶)해져갔다. 중구난방(衆口難防)! 알콜기 뚝뚝 듣는 대화들은 장마철 들판에 흙탕물 흘러가듯 거침 없고 종잡을 수 없었다. 그 가운데 압권이 바로 ‘촌놈’ 논쟁이었다.
50%쯤 알콜에 점령당한 나와 90%쯤 넘어간 ㅈ대학의 ㅂ교수가 논쟁을 벌이게 되었으니. 그야말로 당사자인 내가 보기에도 가관이었다. 큰 체구만큼이나 목소리 또한 우렁우렁한 ㅂ교수와 가끔 흥이 일면 하늘 높은 줄 모르는 ‘하이 톤’의 내가 어우러진 ‘씨름판’이었다.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힐 세계적인 대도시 서울 한 복판에서 현직 교수 두 사람이 ‘누가 더 촌놈이냐?’는 문제로 자웅을 겨루게 되었으니, 그 모습좀 상상해 보시라.
‘자신이 더 촌놈임’을 입증해보이는 것이 이 자리의 논점이었다는 사실은 더욱 더 기상천외한 일이었다. 우리는 좌중으로부터 자신이 더 촌놈임을 인정받으려 기를 쓰며 ‘되도 않은’ 변설들을 늘어 놓았던 것이다. 급기야 자신들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고향까지 들먹이게 되었다.
밤을 꼬박 지새워도 두 ‘얼간이들’(ㅂ교수에겐 죄송!)의 입에서 흘러 나오는, 별별 희한한 고향 이야기들은 끝을 보일 기색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어부인의 지엄하신 귀가명령에 똥줄(?)이 바짝 타들어 가고 있던 ㅅ대학의 ㄱ교수가 기발한 제안을 했다. 고향마을에 언제 ‘전기’가 들어 왔느냐는 것을 ‘촌스러움’의 척도로 삼아 승부를 결(決)하자는 중재안이었다. 두 얼간이들의 ‘촌스러움’에 한 술 더 뜰 만큼 지극히 ‘촌스러운’ 제안이었으니, ‘촌스러움’의 혈투를 벌이는 링 위에서야 승부의 기준으로 이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을까? 자리를 가득 메운 심판들의 승인 하에 우리는 그 조건을 수락했다.
대학 4학년 시절이던 70년대 중반이나 되어서야 석유 등잔불의 고역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나는 내심 승리의 쾌재를 부르고 있었다. 득의만면한 표정으로 내 고향의 원시성(?)을 설파하고 난 나는 분명 주눅이 들어 있을 ㅂ교수의 표정을 훔쳐 보게 되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웬 일이란 말인가. 풀 죽어 있어야 할 그의 얼굴에는 번질번질 환한 미소가 번지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는 냅다 외쳐대는 것이었다. “내 고향엔 아직도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설마 그럴 리가 있는가. “우째 이런 일이?”라는 탄식을 내뱉으면서도, 나는 물론 좌중의 누구도 그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러자 그는 품 속에서 세련되고 앙증스런 휴대전화를 꺼내서 우리의 코 앞에 들이댔다. 지금 당장 자신의 고향마을에 전화를 걸어 확인해보라는, 최후의 일갈이었다. 그야말로 ‘확인사살’인 셈이었다. 보기 좋게 나는 KO패를 했고, 그간 자랑스럽게 차고 있던 ‘촌놈’의 챔피언 벨트를 그에게 넘겨야 했다.
*****
60년대 이후부터 우리는 가난하고 원시적인 고향으로부터의 대탈출을 시작했다. 매판자본(買辦資本)과 베트남에서 벌어 들이던 달러 덕분에 가속화 되던 이 땅의 산업화는 우리의 고향을 텅텅 비게 만들었다.
식모살이나 여공으로 떠난 고향의 누이들, 건설현장이나 공장의 잡역부로 떠난 고향의 아저씨나 형님들. 이들의 빈 자리는 아직도 채워지지 않은 채 시간이 정지된 추억의 공간으로 남아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 우리의 집단 무의식 속에 ‘고향’은 자랑이나 자부심 대신 ‘열등의식’의 본향으로 각인되어 있었다.
내가 탈향의 대열에 합류할 수밖에 없었던 70년대초부터 8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촌놈!’은 그 자체가 ‘욕’이었다. 하기사 서울 토박이를 제외하면 대한민국 국민치고 촌놈 아닌 사람은 누구일까. 그런데도 모두들 촌놈이란 렛텔을 혐오했다. 말하자면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부정인 셈이었다. 모두들 ‘촌놈 아니기 위해서’, ‘촌놈이 아닌 척 하기 위해서’ 무진무진 애를 쓰던 ‘가련한 세월’을 공유하게 된 것이다.
갓 도회에 나온 우리의 선남선녀들은 자신들에게 늘어붙은 고향의 ‘때’를 벗기 위해 애를 쓰곤 했다. 사투리를 내팽개치고, 의상을 바꾸었으며, 화장술을 배웠다. 명절 때 고향에 내려온 이른바 ‘상경족’들의 모습은 경이로왔다. 생소하면서도 매력적인(?) ‘서울 말’, 머릿기름 쳐발라 곱게 빗어 제낀 깍두기 머리, 원색적인 입술화장, 쫙 다려입은 신사복과 숨 막히던 짧은 치마... 이들의 변신과 ‘촌놈 콤플렉스’의 변증법적 상관작용은 고향의 파괴와 상실이라는 비극적 상황으로 나타났고, 그 상황이야말로 우리 모두를 돌아갈 곳 없는 ‘도시의 유목민’으로 몰아가고 말았다.
*****
그러나, 세월은 흘러도 인생살이는 돌고 도는 것. ‘손오공이 뛰어봐야 부처님 손바닥이듯’ 우리가 제아무리 발버둥쳐도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본향을 벗어날 순 없는 일 아닌가. 멀어지려 할수록 자신이 빠져나온 본원에 끌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운명적 존재가 인간인 것을.
이미 고향처럼 되어버린 타향에서 나는 많은 사람들을 접한다. 좀 뭣하지만, 나는 ‘촌놈’의 척도를 가지고 그들의 무게와 깊이를 재곤 한다. 그들은 세 부류로 나뉜다. ‘촌놈’이란 말을 혐오하면서 자신의 ‘촌놈性’을 한사코 부정하는 부류가 그 하나이며, 자신의 ‘촌놈성’을 병적으로 강조하는 부류가 그 둘이며, ‘촌놈성’의 의미를 내면화시켜 음미하면서 자신이 촌놈일 수밖에 없는 점을 담담히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부류가 그 셋이다.
아까운 시간을 버려가면서까지 이 자리에서 거론할 가치가 없는 것은 첫 번 째 부류다. 이들은 촌놈 소리만 들어도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소인배들이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란 점에서 그다지 소망스럽지 못하기는 두 번 째 부류도 첫 부류와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촌스러움’이나 ‘촌놈’이 갖는 긍정적 의미를 깨닫고 있으며, 그것들을 강조함으로써 오히려 자신들의 열등감을 해소해 보려는 적극적 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은 첫 번 째 부류와 차원을 달리 한다. 그러나, 세 번 째 부류만큼 이른바 포스트모던 시대의 소망스런 군상도 없을 것이다. 사라진 고향, 죽어버린 고향이 되살아날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도 바로 이들로 인해서다. 겸허를 바탕으로 자신의 순수성을 자각한 자만이 스스로 ‘촌놈’임을 인정할 수 있다. ‘촌놈’의 대립어는 ‘도회놈’이다. ‘산업화, 물신주의, 파편화, 비인간화’가 도회의 특징이라면, ‘공동체 의식, 인간주의, 자연환경’ 등은 시골(촌)의 특징이다. 물론 그 동안 시골도 많이 변했다.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시골이 갖고 있던 미덕을 도시에서 발견하는 경우도 더러 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그간 펼쳐 왔던 ‘촌놈’의 담론도 바뀌어야 한다. 촌놈들 스스로 물리적인 ‘촌놈’으로부터 탈출하여 정신적인 ‘촌놈’으로 상승되어야 한다. 말하자면 ‘철학적인 촌놈들’의 시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촌놈’의 철학성을 인정한다면, 우리 모두 ‘나는 촌놈이다!’라는 구호를 입에 달고 다녀야 한다.
*****
챔피언전에서 상대편의 강한 스트레이트 펀치에 걸려 불의의 KO패를 당하긴 했으나, 나는 어쩔 수 없는 ‘촌놈’이다. 타향살이 30여년, 많은 것들이 변했다. 나도 변하고, 세상도 변했다. 그 변한 것들 가운데 변할 수 없는 것은 우리는 모두가 촌놈이라는 사실이다. 어쨌든 촌놈 만세다.
2003. 5. 25.
2003-05-2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