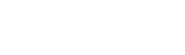쓸쓸한 설을 맞으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2-01-23 20:37 조회 108회 댓글 0건본문
그 옛날의 설날엔
추워도 좋았고
옷이 좀 헐어도 좋았다.
추우면 추운대로
애고 어른이고 몰려 다니며
서로의 체온으로 추위를 녹일 수 있었다.
섣달 그믐날이면
동네 방앗간집 마당에는
찬 바람에 김 올라가는 떡가래가
물소래기에 수북수북 서려 쌓이고
건넌집 마당에서 들려오는 돼지 멱 따는 소리로
골짜기가 들레였다.
부지런한 집에서는 벌써 설떡을 쪄내
큰 집, 작은 집 돌리기에 바빴고
1년내 가난했던 가장들도 이 날만큼은
갓 잡은 돼지고기 몇 근
발발 떨며 짚오리에 묶어들고
종종걸음으로 집으로 돌아가곤 했다.
축구가 무언지
월드컵이 무언지
알 수도 없던 시절이었건만
입에 선지피를 묻히고
돼지 각을 뜨던 아저씨들 언저리에
군침 흘리며 늘어섰던 아이들.
돼지 오줌보가 발라지기 무섭게
헐벗은 옷에 불알들만 달랑거리며
논바닥으로 김 오르는 축구공을 몰고 내달렸다.
동구 밖에
돈 벌러 나간 누이 오빠들이
보따리 하나씩 들고 나타나면
동네는 다시 한 번
흥분과 환호로 들레였다.
게딱지같은 초가집 대문에서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큰 오빠 작은 오빠 큰 올케 작은 올케
큰 조카 작은 조카 등등...
수많은 식구들이
일렬 종대로 줄지어 나오면
보따리에 든 물건이 너무 적어
쥐꼬리만큼 벌리는 돈푼들
꼬박꼬박 모았다가
체면치레로 사온 설 선물이 너무 적어
대처에 나갔던 오빠 언니들은
반가움보다 걱정이 앞서던 것이었다.
그나마
해 지도록 아무도 돌아오지 않는
집의 어머니 아버지 동생들은
풀이 죽고
굴뚝에는 연기조차 오르지 않았다.
'건넌 집 영자는
서울 가서 돈 잘 벌어
보따리 그득 설 선물 들고
고향을 찾아 오건만
우리 집 순이는 올해도 공치나 보다'
가슴이 미여지는 아버지 어머니의
한숨을 들어가며
숨 소리조차 못 내던
가여운 아이들의 텅 빈 설명절도
그 동네엔 있었다.
설날 아침엔
차마 입을 수 없어
혹시 손때라도 탈까봐
만져 보기에도 아깝던 그 설빔을
아낌없이 꺼내 입고
1년에 하루 살고 말 것처럼
호사를 부리던 것이었다.
돌아가신 조상님과
살아계신 어른들 앞에서
살아 숨 쉬는 젊음의 아름다움을,
당신들의 뒤를 이어
이 좁은 골짜기를 잘 건사하겠노라는 패기를
맘껏 과시하던 것이었다.
그러니 돌아가신 조상님들은
잘 쉬시며 우릴 좀 도와주시고
살아 계시는 어른들은
좀더 사시어
그 모습좀 보아 주십사,
그렇게 기원하는 것이었다.
물 흐르듯
세월은 잘도 흘렀다.
모진 세월의 위세로도 마모되지 않은 것일까,
그 골짜기의 칼바람은 여전한데,
동네를 쩌렁쩌렁 울리던 왜갈영감도
윷판을 주름잡던 성보영감도
오지 않는 딸 아들 생각에
눈물 떨구던 주름 투성이의 선구영감도
이젠 없다.
그 뿐인가.
돼지 오줌통이 깨어져라
악을 쓰던 코흘리개 아이들도
모두 사라지고 말았다.
고향은,
마냥 설레기만 하던 고향의 설은
이제
마음 속에 있을 뿐.
설의 추억을 감싸고 있는
마음마저 가버리면
이 땅엔 무엇이 남을까.
무엇이 남아
우리가 여기에 왔다 갔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까치설날
텅빈 교정에서
백규,
여러분께
세배 올립니다.
2004-01-21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