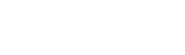화롯불이 사그러들기 전에...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2-01-24 03:22 조회 169회 댓글 0건본문
두메솔 선생님,
화롯불이 채 사그러들기도 전에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따끈따끈한 시들이 아직 식기도 전에
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
병원에 누워 창밖으로
건강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내 이웃들처럼
힘 없는 미소와 수심이
캔버스의 물감처럼 번져가는
세밑입니다.
먼 길을 가고 싶어도
가다가 꺼내볼 내 의지가
한 뼘밖엔 되지 못할 듯하여
지레 겁을 먹고 포기하는
우중충한 겨울 아침입니다.
이 우중충한 길 끝머리 어딘가에
해맑은 태양이 기다릴 듯도 하지만,
지금은 알 수 없는 침묵 뿐입니다.
어떻게 비집고 지나가야 할지 알 수 없는
천근 무게의 어두움 뿐입니다.
***
사모님께서 편찮으셨군요.
그래도 많이 좋아지셨다니 다행입니다.
'시도 약이 될 수 있다면' 어쩜 사모님께
선생님은 명의이실 수 있겠군요.
예로부터 어떤 시인들은
가난과 병고 속에서 시를 썼는데,
시가 사람을 가난하게 혹은 아프게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과 병고를 견딜 수 있게 만든 명약은 아니었을까요?
미리 새해인사 올립니다.
좋은 씨앗들을 갈무리하셨다가
봄이 오는 길목에 열심히 뿌려 두시기 바랍니다.
백규 드림
>두메솔 시 [12월의 서정]
>
>
>1. 화롯가에서
>2. 안개
>3. 병원에서
>4. 길처럼 간다네
>5. 여름은 남을 거다
>----------------------------------
>
>
>
>1. 화롯가에서
> 두메솔 이재관
>
>
>화로 온기에 손가락을 펴보네
>왼손 손가락을 꼽아보네.
>천천히 하나, 둘, 셋,
>어제 헤어진 듯 픽 웃으며 다가오는
>사랑했던 사람들
>왼손은 어눌하여 무작정 잡아두기 좋았네.
>
>오른 손으로 더 꼽아보네.
>하나, 둘, 셋,
>보고 싶은 친구들
>손바닥 들녘 위로 뒤엉켜 흐르네.
>무수한 조각구름 그림자처럼
>주름진 들풀은 마음만 타고
>
>오른 손으로 재빨리 잡을 수 있었건만
>겨울 하늘엔 흔적 없네.
>남쪽 지방은 폭설이라는데
>열 손가락 메말라 있네.
>-----------------
>
>
>
>
>2. 안개
> 두메솔 이재관
>
>
>안개는
>떠나기 위해 오는 거다
>생전 떠나지 않을 것처럼
>자욱하게 옷 사이 스며들고
>덜덜 떨며 혀끝의 단 맛을
>탐미(耽味) 하게 만든다.
>
>세상 천지에
>둘만 있다는 걸 확인시켜주고
>훌훌 떠나가는 거다.
>
>공항 고속도로의 안개여
>예약도 없이 달려본들
>에멜무지로 해보는 사랑인 걸
>내 밥상은 여느 때처럼
>버섯과 온갖 야채 넣은 스프 잡곡밥에
>고등어 한 토막과 유리창 물방울
>오, 너의 흔적들
>햇살 눈부시다.
>-----------------
>
>
>
>
>3. 병원에서
> 두메솔 이재관
>
>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들을 모아놓은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
>종합병원의 작은 정원
>숨죽인 측백나무 벚나무 아래
>벤치에선 소란피우는 사람이 없고
>새들은 닫힌 창문 주변을 걱정스레 서성댑니다.
>정원사는 치료하듯 정갈하게 낙엽을 쓸어내고
>택시기사들은 양손으로 운전대 잡은 채
>시계탑의 맑은 자판을 염원하듯 쳐다봅니다.
>
>아픈 사람들과 더불어 아파해주는 사람들이
>한 눈에 다 보이는 높은 시계탑이 있고
>저 아래 자동차와 사람들은 장난감처럼
>작게 보이지만 열심히 굴러다닙니다.
>함께 아파해주는 사람이 환자보다 많고
>아픔으로 이어져 우린 결국
>누구나 한 군데쯤 아픈 장난감인 것을
>말할 새가 없었나, 시계탑은
>언제부턴가 두 팔로 신호 하고 있었습니다.
>-----------------
>
>
>
>4. 길처럼 간다네
> 두메솔 이재관
>
>
>액셀을 밟으면 길이 달려들지
>놀랄 것 없다네 길은 사실 움직인다네.
>길들은 늘 길을 가고 있다네.
>곧바르든 꾸불꾸불하든
>오솔길이든 8차선 대로든
>
>가다가 서는 것은 사람이지
>길에게 끝이란 없다네
>다른 길을 만나면 합쳐지고
>막다른 길에선 유턴을 하지
>꿩 노루 발자국 끊겨도
>껑충 뛰어 어디선가 계속되는 법
>봄으로 시작되어 겨울로 끝나는 게 아니지
>
>마지막 말은 하는 게 아냐
>시작하는 말은 잘 준비해야 하지만
>마지막 말은 준비하는 게 아냐
>애쓰며 짜내지 마
>영혼의 바람 잦아들면
>잠시 쉴 뿐, 끝은 없다네.
>마지막 말은 하는 게 아냐
>길 위에선 길처럼 그냥 달려가는 거야
>-----------------
>
>
>
>
>5. 여름은 남을 거다
> 두메솔 이재관
>
>
>우리의 여름도 가을도 가는가 보다고
>너는 11월만큼이나 눈물이 많았다
>흔들어대던 봄바람 분홍 꿈들이야
>벌써 몸 야위어 떠난 듯도 하다만,
>너의 여름은 늘 곁에 있지 않으냐
>
>풀밭에 누워 반지 만들던
>그 햇살이 오늘도 싱겁게 웃고 있었다.
>여름은 첫 만남 같이 새롭고
>서투른 사랑은 사그라진 적 없었다.
>별처럼 들썩이는 긴 승부
>수없이 주고받는 눈길이여
>동지섣달에도 풋내와 땀은 있는 걸
>산길 미로 옹달샘과 소나기를
>그만 접어 앨범에 넣으려 하느냐
>
>자연의 계절은 가라 하자
>누가 먼저 떠나든 여름은 남을 터
>남은 자의 땀으로
>흥건히 흐를 거다
>여름의 훈장 달고 껄껄 웃자꾸나.
>-----------------
2008-12-2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